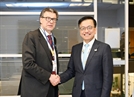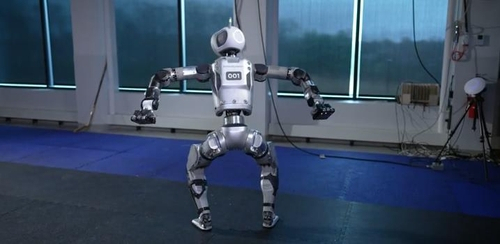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되는 KT 수난사를 보자. 지난 2002년 민간기업으로 바뀐 후 현 황창규 회장까지 최고경영자(CEO)는 4명. 민영화 1기 이용경 사장은 취임 후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으나 다행히 첫 임기를 다 채웠다. 하지만 단임으로 끝났다. 당초 “민영 초대 사장으로 전통을 만들겠다”면서 연임 도전의사를 밝혔는데 공모과정에서 돌연 철회했다. 2기는 남중수 사장. 남 사장은 2008년 연임에 성공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비리혐의로 구속되면서 물러났다.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은 이석채 회장. 이 회장 역시 연임에 성공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자 사임했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4기 황 회장도 바람 잘 날이 없다.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연임했으나 지속적인 사퇴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로 바뀐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여당 등 정치권에서는 경영진을 겨냥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경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고 인사채용 비리·고문료 과다지불 등 쏟아지는 의혹 제기에 노출돼 있다. 지난해 6월에는 구속영장까지 신청됐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두 달 전부터는 차기 회장 선임 프로세스가 타깃이다. 4월17일 국회에 출석한 황 회장에게 더불어민주당·민중당 의원들은 회장 선임 절차가 이례적으로 조기에 가동된다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걸고넘어졌다.
최근에는 실체가 불분명한 단체들까지 이 대열에 합류했다. 차기 선임에 경영진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KT는 지난해 정기 주총에서 정관을 바꿔 회장 선임과정을 기존 두 단계에서 네 단계로 변경했다. 회장 선임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차원이다. 내년 3월 퇴임을 공식화한 황 회장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임에 관여 안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도 의혹 제기는 멈추지 않고 있다.
전임 CEO의 흑역사를 보면 현 경영진을 향한 공세는 ‘우리 편 사람으로 바꿔야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합리적인 의문을 품기에 충분하다. 여기에는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는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김없이 경영진을 향한 노조와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이 시작되고 여당 등 정치권도 가세한다. 이어 먼지떨이 식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영진 책임론이 불거지고 중도에 불명예 퇴진하거나 사퇴 압박에 시달리는 게 정례화되다시피 했다. 현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이 경영고문 부정위촉 의혹을 수사한다며 지난달 5일 분당사옥 전산센터에 이어 최근(15일)에도 광화문 사옥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겉으로는 횡령·배임 혐의 등을 거론하지만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주기적으로 ‘CEO 리스크’가 불거지는 사이 골병드는 것은 결국 조직과 직원들이다. 그때마다 주가가 출렁이니 주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도 대주주 적격심사 등으로 케이뱅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비롯해 그룹 상황이 여의치 않다. 아현지사 화재 사건이나 부정채용처럼 명백하게 잘못이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대로 처리하면 그만이다. 그동안 일부 경영진의 경우 정치권에 줄을 댔다는 의심을 살 만한 행태를 보였던 것은 사실이다.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KT는 엄연한 민간기업이다. 주인은 정부도, 정치권도, 시민단체도 아니다. 국민연금이 12% 정도 가지고 있을 뿐 정부 지분은 한 주도 없다. 그런데도 여전히 공기업이라고 여기는지 흔드는 세력이 많다. 특히 정부나 정치권이 경영권 문제 등에 이래라저래라 지적하고 간섭하는 것은 주주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마땅히 청산돼야 할 적폐인데도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다. 오죽하면 직원들 사이에서 “CEO 임기를 정권 임기에 맞추든지 공기업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푸념이 나오겠는가. 이제는 KT가 진정한 국민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놓아줄 때도 됐다. /sh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him@sedaily.com
sh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