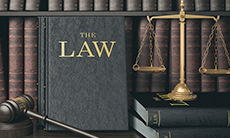이재명 정부의 원전 업무가 둘로 쪼개진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가 맡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고 원전 건설은 기후부, 수출은 산업부가 맡게 됐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춘 기후부가 미래 전략산업의 기반인 에너지 정책을 책임지는 데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다. ‘탈원전’ 오점을 남긴 문재인 정부에 이어 새 정부가 ‘탈원전 시즌2’를 자초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산업과 에너지 정책의 분리 땐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당장 기후부가 에너지 정책을 탄소 중립에 맞춰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값비싼 재생에너지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게 뻔하다. 더 큰 문제는 원전의 건설·수출 이원화가 원전 생태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신규 원전 건설과 기술 투자에 소극적인 나라의 원전을 과연 어느 국가가 선택하겠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는 우리나라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과 스마트100에 높은 점수를 매겼다. 한국 원전은 밖에서 높게 평가받는데 안에서는 되레 홀대받는 모양새다.
국내 원전 생태계가 튼튼해야 해외 수주도 가능하다. 규제 부처에 정책을 맡기고 수출 강국이 되겠다는 발상은 모순이다. 지금은 이념에 발목을 잡힐 때가 아니다. ‘SMR 특별법’을 만들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협의를 조정해 한국형 원전의 미국 수출 길을 열어야 한다.
다른 정부 조직 개편도 마찬가지다. 예산 기능 분리는 예산의 정치화를 부를 수 있고 검찰청 폐지는 범죄 수사 통제 기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속도전에 매달릴 일이 아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로 개명당할 위기”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보완수사권, 권한 조율 등 검찰청 폐지의 쟁점은 물론 정부 조직 개편도 정치와 이념을 배제하고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을 두고 경제 원로들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벼랑 끝에 선 상황에서 조직 개편이 주도권 다툼으로 이어지면 공멸”이라고 경고했다.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거나 국민 부담을 키운다면 개편의 명분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