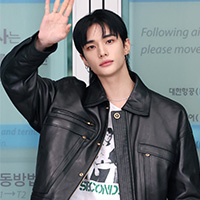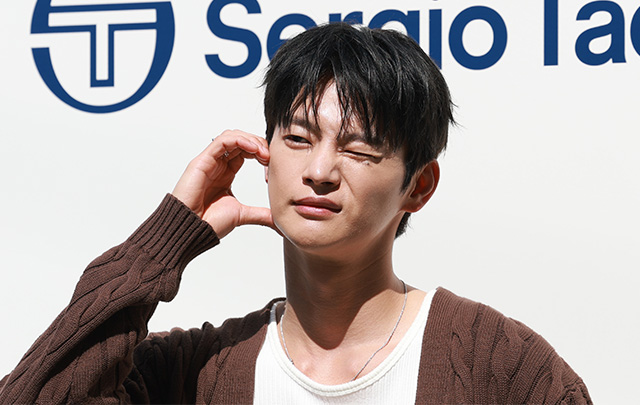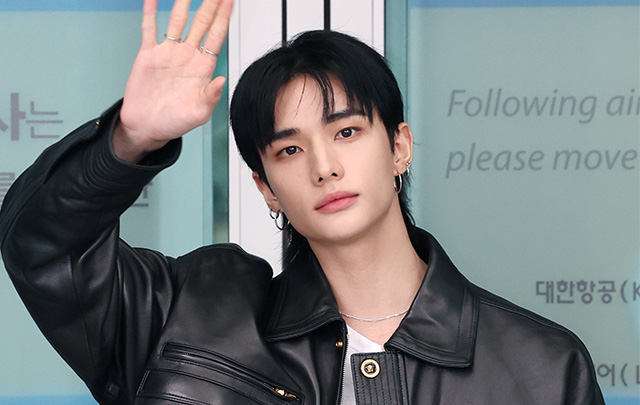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주요 제조업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미 철강이나 석유화학·조선에서는 중국의 물량 공세에 밀려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배터리와 자동차·가전제품 같은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과거에는 저렴한 인건비나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이용해 저가 제품 시장을 잠식했다면 이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가 프리미엄 제품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중국의 로봇청소기를 들 수 있고 이제는 TV나 휴대폰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해주는 것은 탄탄한 과학기술력이다. 중국은 이미 2019년부터 학술 논문 수나 국제 특허 수에서 미국을 누르고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상위 논문을 따지는 네이처 인덱스에서도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응용 기술 면에서도 중국의 화웨이가 세계에서 국제 특허를 가장 많이 내는 기업이며(2위는 삼성전자), 상위 10대 기업 중에 중국 기업이 4개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미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인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다. 특히 AI 분야 최상위 연구자의 절반 정도가 중국 출신이며 지난 10년간 생성형 AI 분야 특허의 70%는 중국에서 출원한 것이라고 한다.
중국은 어떻게 해서 이처럼 짧은 시간에 과학기술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 필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을 들고 싶다. 첫째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과학기술 정책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과학기술 5개년 계획을 14차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다. 무려 70년 동안 일관성 있게 과학기술 진흥 정책을 추진해온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과학기술 정책도 바뀌기 일쑤고 심지어는 느닷없이 연구비가 삭감되기도 한다. 이래서는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어렵다.
둘째는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특별한 대우다. 중국은 2009년부터 ‘천인계획(千人計劃)’을 통해 해외의 우수 과학자를 파격적인 대우로 대거 유치한 바 있다. 또한 중국 내에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과학 영재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때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선발된 영재들은 어린 나이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고 대학에서도 일찍이 연구 과제에 참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고교의 영재 육성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대학 입시 제도상의 여러 제약 때문에 대학 진학에서도 그 재능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 예로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우승한 학생이 서울대 입시에서는 떨어졌지만 미국 매세추세츠공대(MIT)에서 장학금을 받아 유학을 간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극심한 의대 선호 현상으로 과학기술 분야로 진학하는 우수 인재가 줄고 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최고의 직업이 과학기술자인 중국과는 인재 확보 면에서 처음부터 경쟁이 안 되는 것이다.
셋째는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육성이다. 중국은 1991년 ‘211공정’을 시작으로 1998년의 ‘985공정’ 그리고 2017년의 ‘쌍일류(雙一流)’ 정책을 통해 총 3000여 개의 대학 중에서 40개 정도의 대학을 선발해 연구중심대학으로 집중 육성했다. 그 결과 2025년 ‘QS’의 아시아 대학 순위에서 베이징대가 1위를 차지하고 푸단대·칭화대·저장대 등 중국 4개의 대학이 10위 안에 드는 성과를 얻었다. 반면 한국 대학들의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올해는 겨우 1개 대학만이 10위 안에 남았다. 얼마 전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는 한국 경제를 ‘끓는 물 속의 개구리’에 비유한 바 있다. 외부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상황을 경고한 것이다. 최근 드러나는 중국의 과학기술 굴기를 보며 한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이 비단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