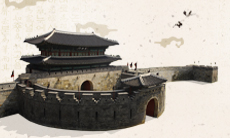그리스는 당장 30일로 다가온 15억유로의 국제통화기금(IMF) 채무를 상환하고 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등 숱한 과제를 떠안고 있다. 문제는 그리스가 수년째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골칫덩어리로 지목될 만큼 이미 독자적인 부채 상환이나 구조개혁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고질병인 정실 자본주의와 낮은 생산성을 탈피하기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반면에 그렉시트가 발생한다면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인접국의 부패문제가 부상하면서 남유럽국가를 중심으로 유로존 이탈이 전염될 가능성도 있다. EU는 다른 남유럽 국가에 대한 전염 예방조치를 추진하고 있다지만 경제적 피해는 막더라도 반긴축을 부르짖는 좌파정당의 이데올로기 확산까지 저지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스 사태는 유로존이 과연 지속 가능한 체제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리스 사태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유로존 위기는 언제든 재발하거나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로존 존립을 위해서는 통화동맹을 넘어 금융동맹·재정통합으로의 발전이 불가피하지만 북유럽권의 반발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이런 근원적 모순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유로화 해체라는 유령은 계속 유럽을 배회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와 경제계는 유로존의 장기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전제 아래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