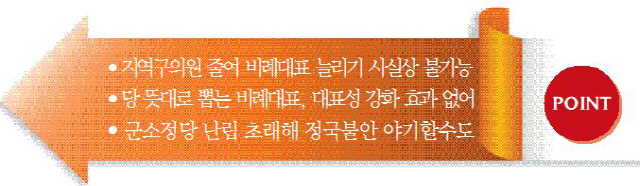지난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선거제도 개혁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합의 이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과 한국당 간의 합의문 문구 해석차이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가 파열음을 내고 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병립식 비례대표를 혼합한 방식이지만 소선거구 다수대표제가 거대정당의 독식을 고착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에 정당 득표율에 완전히 연동시키는 비례대표제가 대안으로 거론돼왔다. 도입 찬성 측은 각 당의 전체 의석수가 정당지지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득표-의석비율의 비례성을 높여 과도한 사표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연동형 비례제로 가면 의원 정수 증원이 불가피하고 군소정당 난립으로 정국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일부 학계와 정계에서 부르짖듯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한국 정치를 구원할 수 있을까. 구원까지는 아니어도 한국 정치가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까.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 빈말이 아니다. 진심으로 바란다.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도 우리 국회나 정치가 별로 선진화되지 못한 것으로 봐서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아닐까 싶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명분은 국회의석의 비례성 강화를 위해서라고 한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 간 괴리를 최대한 좁히자는 말이다. 당연히 비례대표를 대폭 늘려야 한다. 현재처럼 전체 의원 300명을 유지하려면 250여개 지역구를 200여개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석 정도로 해야 한다. 의원들이 찬성할 리 만무하다. 의원들의 솔직한 속내는 가능하다면 의원 정수를 400명 정도로 늘리고 싶을 것이다. 지금처럼 지역구 250명 정도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150명 정도로 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의원 수가 적다, 의원 수가 늘어나도 국회예산은 그대로 하겠다는 등 벌써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 330명 혹은 360명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말하나 마나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렵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국민의 수용성이다. 제아무리 개혁방안임을 내세워도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강행할 수는 없다.
법리상 문제도 있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와 별도로 행해지는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한다. 과거 지역구 후보가 얻은 표만을 계산하던 방식보다는 진일보한 것이다. 비례대표의 심각한 문제는 선출 과정에서 국민들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당별 비례대표 선정, 순위 결정 과정 등에 있어 국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정당, 정확히 말해 이른바 지도부 뜻에 좌우된다. 비례대표 선정을 두고 공천헌금·특별당비·밀실야합·뒷거래 등 늘 잡음이 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정작 국민들은 그렇게 선정된 비례대표 후보를 알지도 못한 채 표를 던진다. 정당별로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개할 때 반짝 관심을 모으기는 한다. 하지만 비례대표 후보를 보고 정당에 투표하는 유권자는 없다. 비례대표 제도 하에서 구속명부제는 위헌이라는 의견도 있다. 유권자들이 순위나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정당이 내세우는 고정된 비례대표 명부는 직접선거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결국 의원 수를 늘리는 연동형 비례대표는 비례성 강화가 아니라 당권 강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일부 의견은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예일대 로스쿨 교수인 잭 볼킨은 “민주주의적 문화가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 자체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한다. 제도에 녹아 있는 역사와 문화 전통은 무시한 채 제도만 베끼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 남쪽의 귤이 북쪽에 와서 탱자가 되는 사례는 하나둘이 아니다. 요즘 (아니 언제나) 시끄러운 대학입시제도만 봐도 그렇다. 공교육을 살리고 점수만으로 줄 세우는 입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도입한 제도가 입학사정관제도다. 미국 등지에서 입시의 뼈대로서 문제 없이 운용되는 것은 절대적 상호신뢰라는 사회적 자본 때문이다. 적대적 상호불신이 일상화된 우리나라에서 정착하기 불가능한 제도라는 말이다. 선거제도 역시 비슷하다.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특정 정당이 절대 다수표를 결집하기 어렵게 만든다. 군소정당이 난립할 수 있다. 이런 제도를 독일이 채택한 것은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나치당)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와 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한 고심의 산물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아름다운 목적(협치) 때문에 채택한 제도가 아닌 것이다. 최근 경험은 독일 정치의 최대 약점인 불안정성을 웅변해준다. 독일은 2017년 9월 총선을 치른 후 5개월이 넘도록 연정구성이 되지 않은 채 표류하다가 올해 3월이 돼서야 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다. 독일이 잘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우리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논거로는 쓸 수 없다는 말이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우리 정치에 있어 만악의 근원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이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니면 정치를 잘할 수 없다고 한다. 대학생들의 기말고사가 한창이다. 점수가 나쁜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자신을 질책해야 마땅하다. 안 좋은 볼펜을 탓하면서 명품 만년필을 사주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우기는 학생에게 뭐라고 해야 할까.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