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에볼라, 니파,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들의 최신 버전이면서, 기후변화와 깊이 연결된 현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박쥐, 천산갑 등 야생동물을 식용이나 약용으로 쓰면서 동물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아온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기후변화’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산림 벌채, 광산 개발, 댐 건설, 도로 개통, 신도시 건립, 축사 조성으로 야생동물이 사는 서식지가 파괴됐다. 이들 환경파괴 행위는 기후위기를 초래한 요인이기도 하다. 서식지와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종 다양성이 줄어들고, 다양한 생명 사슬의 연결로 병원균이 소수의 생물 종에만 집중되지 않게 하던 ‘희석효과’가 무력해진다. 생태계가 단순해질수록 병원체의 확산 효과, 즉 전염성이 커진다는 뜻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스톡홀름 패러다임’이라는 이론에 따르면 “기후 환경이 급격히 바뀔 때 병원체가 새로운 숙주를 찾아 쉽게 공략할 수 있는 ‘병원체의 기회 공간’이 열린다”고 한다. 병원균들이 지구 온난화에 적응하면서 인간 체온 37도의 장벽을 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온난화 때문에 사람이 병원균에 감염될 민감성이 높아졌다는 점은 세계보건기구도 인정한 사실이다.
한국인권학회장, 국제앰네스티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중견 인권학자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가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짚었다. 열대야에 잠 못 이루는 옥탑방, 냉해로 망쳐버린 과수농사만이 기후위기 탓인 게 아니라, 천식이 심해진 아이의 기침 소리에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음을 따지고 들었다. 기후위기에 관한 많은 책들이 믿을만한 과학정보와 통계·수치로 접근하는 것과는 달리 인간의 구체적인 경험과 인식, 사회·정치적 문제를 중심에 두고 조명했다는 점이 이 책의 특별한 의미다.
저자는 우선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기후위기가 겉으로는 관련 없어 보이는 현상들을 은밀하게 연결하며 인간사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고, 인재(人災)가 초래한 팬데믹과 기후변화를 근본적으로 따지면서 ‘인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코로나19는 재난이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의 악영향은 ‘차별적’임을 보여주었다. 사회의 약한 고리에 속한 계층에게 코로나19는 직격탄이 되었다. 바이러스 사태는 재난의 사회적 차원을 우리에게 각인했고, 이 점은 기후위기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특징이다.”
저자가 종말을 고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탄소 사회’는 “탄소 자본주의의 논리와 작동방식을 깊이 내면화한 고탄소 사회체제”이며 “탄소 자본주의에서 파생된 불평등이 전 지구적으로 깊이 뿌리내린 사회 현실”을 뜻한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궁극적으로 ‘탄소배출 제로’를 추구하지만 저자는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인과의 그물망인 환경파괴, 생물 다양성 감소, 6차 대멸종, 육식과 식량 생산을 포함한 먹거리 문제, 정치사회 시스템의 리스크 등을 함께 조망해야 한다”면서 “탄소 감축과 에너지 전환만 이야기하면 자칫 나무만 보고 숲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책은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탄소 사회의 종말’을 고하며 다섯 가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한다. 기후 문제는 과학적 패러다임을 초월해 불평등·젠더·문화 규범 등 사회적 차원을 부각해 접근해야 한다.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한 책무 유기는 ‘생태살해(Ecocide)’ 범죄의 관점에서 다룰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책은 기후 온난화를 넘어 ‘지구 가열화’ ‘지구 고온화’ 등의 표현을 동원하고, 기후위기를 ‘기후비상사태’로까지 부른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의 근원에는 기후변화라는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자각하라는 뜻에서다. 2만5,000원.
/조상인기자 ccs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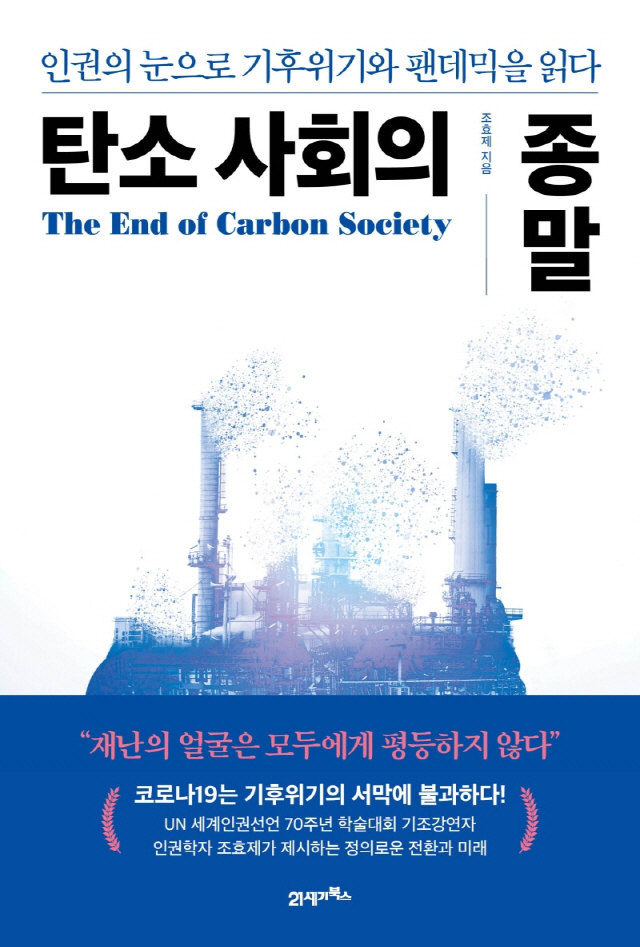

 ccsi@sedaily.com
ccs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