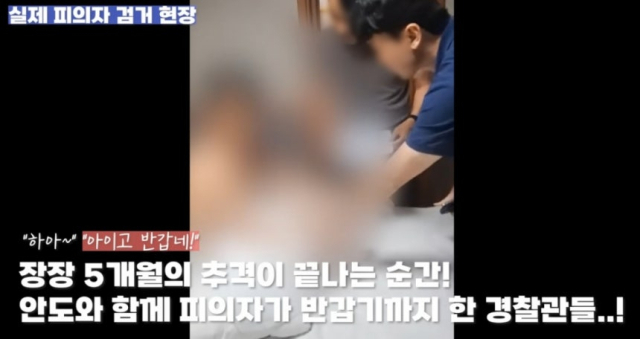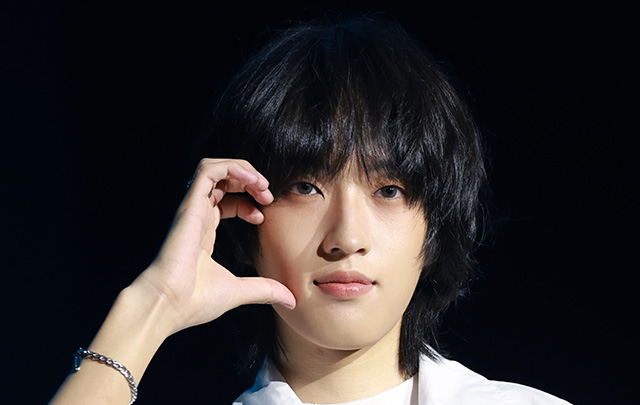“비혼 출산을 새로운 가족 형태로 인정하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한 말이다. 지난달 말 나온 통계청의 ‘2024 출생 통계’는 강 비서실장이 언급한 ‘사회적 목소리’를 수치로 뒷받침한다.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1만 3800명, 전체 출생의 5.8%를 차지했다. 2020년 2.5%에서 불과 4년 만에 두 배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배우 정우성, 모델 문가비의 혼외 출산, 배우 이시영의 이혼 후 ‘냉동배아 임신’, 방송인 사유리의 비혼 출산도 달라진 세태를 보여줬다. 20대 여성의 비혼 출산 찬성 비율이 2008년 28%에서 지난해 42%로 뛰었다는 점은 사회 인식의 급격한 변화를 방증한다.
비혼 출산 관련 제도 개편 움직임도 빨라졌다. 이달 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이 재발의한 ‘생활동반자법’은 성인 두 명이 합의해 동거 관계를 신고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주거 지원 등에서 부부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한다. 출산·돌봄휴가, 의료 결정권, 장례 절차까지 가족 권리와 의무도 부여된다. 이는 혈연·혼인 중심의 유교적 가족관을 넘어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시민 결합’을 제도화하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다만 최근 비혼 출산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데는 ‘자유로운 선택’ 외에 또 다른 요인도 작용하는 듯하다. 서울 집값이 ‘넘사벽’으로 치솟은 가운데 주택 대출에서 혼인 가구가 불리한 소득 기준을 적용받으면서 ‘비자발적 비혼 출산’이 확산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사실혼, 위장 이혼을 통해 각종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제도가 현실과 엇박자를 내면서 ‘역(逆) 인센티브’를 낳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비혼 출산 대책과 정치권의 생활동반자법 추진은 가족 다양성, 출산율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기회다. 그러려면 사실상 비혼을 독려하는 듯한 불합리한 주택 관련 대출 제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anul@sedaily.com
hanu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