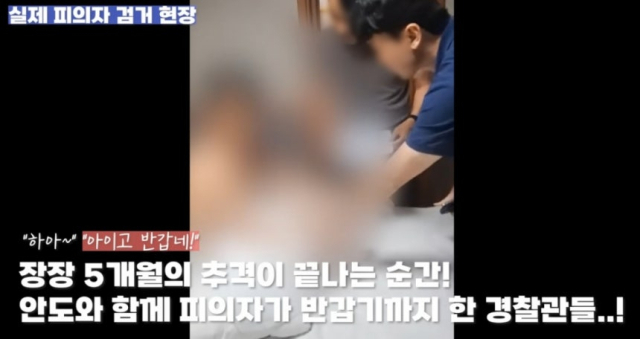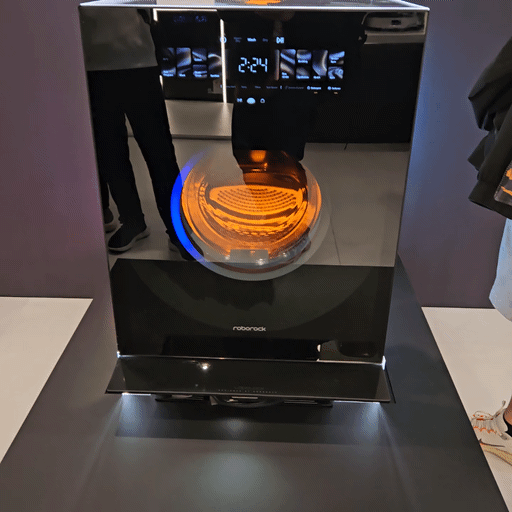<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데스크 칼럼] 虎視牛行과 기자실 폐쇄
입력2007-06-11 17:41:29
수정
2007.06.11 17:41:29
“곡필은 하늘이 죽이고 정필은 사람이 죽인다”는 경구는 우리 같은 언론인에게는 만고의 금언처럼 각인돼 있다. 군사독재 시절 일부 언론이 곡필하면서 현실과 멀어져갔던 문구지만 언론인의 가슴 한켠에 비수처럼 웅크려 자리 잡고 있다. 술자리에서 숱하게 오고 갔던 이런 기자론(記者論)들은 책 한권을 내도 모자랄 판이다.
한국 언론의 위기가 거론되고 있다. 가뜩이나 뉴미디어라는 패러다임에 대응하기도 벅찬데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실 폐쇄조치라는 강수까지 두면서 더 팽배해지고 있다. 일부 언론의 신뢰도 저하 행위와 사회공헌도 하락, 태생적으로 남의 뒤를 캐야만 하는 악역을 맡은 기자들에 대한 사회 일각의 비판적 시각을 고려할 때 자업자득일 수도 있겠다.
지금 기사 송고실을 폐지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개인적인 처지와 상황, 그리고 피해의식도 이해가 된다. 다만 이런 일들이 노 대통령 주변의 언론인 출신인 핵심 참모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에 동업자로서 서글픔을 느낀다. 노 대통령에게 이런 방법들을 조언했던 핵심 참모들은 현장기자 시절 철학 없이 보냈던 사이비 기자였단 말인가 묻고 싶다.
전세계 각국에 197개의 사무실을 운영 중인 국제통신사인 로이터는 ‘미디어빅뱅’시대에 맞춰 인터넷을 활용한 국제적인 뉴스 분업생산시스템을 확대 중이다. 예컨대 단순한 속보나 스트레이트 같은 부가가치가 낮은 기사는 인도 방갈로 현지사무소가 고용한 인도인 기자들이 만들어 제공하고, 로이터의 정규기자들은 분석기사 중심의 부가가치가 높은 기사 제작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디지털시대에 맞춰 선진국 언론사에서는 보도 방식의 일부를 지구 반대편에서까지 아웃소싱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국내 언론은 이런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지 못한 채 가중되는 경영난 속에서 활로를 찾기도 벅찬 상황이다. 노 대통령의 조치는 국내 언론에 국제경쟁력을 갖출 기회조차 상실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인터뷰 기회가 된다면 노 대통령께 묻고 싶은 말이 있다. “대통령께 언론정책을 조언하는 저 언론인 출신 참모들이 현역 기자였다면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역지사지(易地思地)는 국가 통수권자나 참모나 개인이나 모두 항상 가슴에 담고 되새겨야 하는 몇 안 되는 문구 중 하나다. 게다가 현재의 언론정책은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는 것이다. 고급 정보의 흐름을 막으면 국가경쟁력 하락은 불가피하다. 현대는 지식정보시대이고 기업 경영의 속도는 지식정보에 의존해 ‘생각의 속도(speed of thinking)’로 결정되고 운영돼야 하며 그 판단의 기초 데이터가 바로 정확하고 고급스러운 ‘뉴스 콘텐츠’에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에서 세계 정보기술(IT) 업계와 미디어 업계의 거물과 석학들이 참석한 가운데 막을 내린 서울디지털포럼(SDF)에서는 ‘미디어 빅뱅(Media Big Bang:Impact on Business&Society)’이라는 주제로 디지털과 인터넷이 몰고 올 미래와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한 방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TV와 신문으로 대표되는 올드미디어와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뉴미디어가 격렬히 충돌하거나 몸을 섞어 제3의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것은 과거의 미디어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될 것이라는 수많은 예견과 말들이 쏟아졌다.
다 맞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가장 인상적인 결론은 “미디어가 어떤 형태로 진화해도 사회를 올바르게 견인해내기 위해 전쟁터에서, 내전의 현장에서, 혹은 왜곡의 현장에서 전세계 기자들이 견지해왔던 기자정신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 연사의 발언이었다.
치열하게 진열대 전쟁을 벌이는 상품도 지나치게 시대를 앞서가면 진열대에서 곧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게 마케팅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래서 그들은 시대를 딱 반발짝쯤 앞서가는 물건이 히트상품의 대열에 올라섰다고 말한다. 기자생활을 하면서 선배들이 말했고 동료들과 나눴던 문구 중에 ‘호시우행(虎視牛行)’이라는 것도 있다.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걷겠다는 뜻이다. 판단은 호랑이처럼 예리하게 하되 행동은 소와 같이 신중하고 끈기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노 대통령의 최근 언론정책에 주는 메시지가 딱 호시우행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