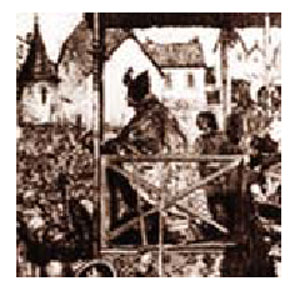|
1095년 11월27일, 프랑스 중부 클레르몽. 성직자 3,000명을 비롯해 수만명의 신도가 운집한 성당 광장에 마련된 연단에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올랐다. 군중은 경외심을 갖고 교황을 올려봤다. 불과 며칠 전 정적이었던 프랑스 국왕 필리프 1세를 과감하게 파문해 교회의 권위를 드높였던 교황이 아닌가. ‘성도여, 예루살렘이 이교도의 발 밑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신도끼리 싸우던 창을 돌려 성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싸우는 자는 예루살렘에 쌓인 수많은 금과 은ㆍ보물을 얻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자는 천국에서 보상 받을 것입니다.’ 열광한 군중의 의해 삽시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진 전쟁 소식은 ‘천국과 보물’을 얻으려는 집단적 광기를 낳았다. 1291년까지 3세기 가까이 소아시아와 예루살렘을 피로 물들인 십자군전쟁이 이렇게 시작됐다. 전쟁에는 교황권을 강화하고 동서교회의 통합을 주도한다는 계산도 깔려 있었다. 성지 회복에 성공한 적은 단 두 차례에 그치고 약탈과 살육으로 점철됐으나 십자군은 상인자본의 출현을 앞당겼다. 수많은 군대가 이동하며 먹고 자고 싸우는 데 들어가는 돈을 조달하고 송금하는 과정에서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중계무역과 금융으로 자본을 쌓고 종국에는 르네상스로 이어졌다. 기독교 문화권으로서 유럽의 정체성도 생겨났다. 이슬람 입장에서 십자군은 ‘악마의 군대’와 다름없었지만 세계가 서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오늘날 십자군은 ‘정의로운 군대’의 대용어로 곧잘 인용된다. 부시 대통령이 ‘현대판 십자군 전쟁’이라고 지칭했던 대테러 전쟁도 아랍인의 눈으로 볼 때는 예전과 마찬가지다. 다른 점이 없지는 않다. 예전 십자군이 상업발달과 자본축적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면 ‘현대판 십자군’은 과도한 전비로 경제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