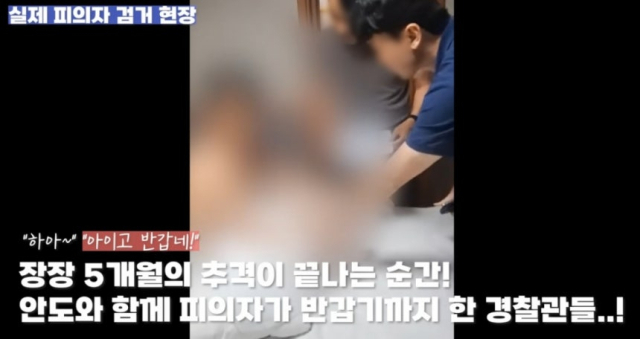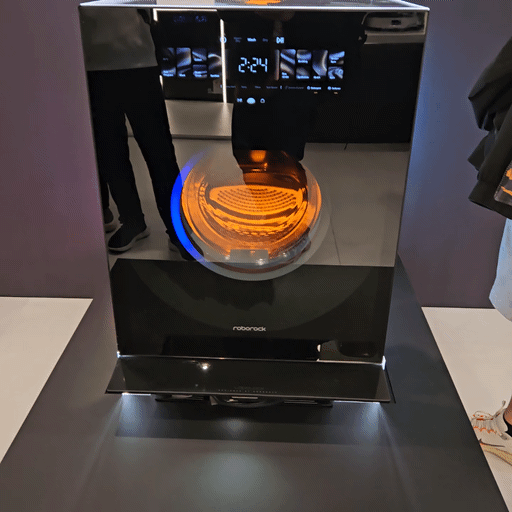|
[오늘의 경제소사/9월27일] 삼국동맹 권홍우 편집위원 1940년 9월27일 베를린. 독일과 일본ㆍ이탈리아가 삼국동맹(Tripartite Pact)을 맺었다. 6개항으로 구성된 동맹조약의 목표는 독일의 유럽 지배와 일본의 아시아 패권. 때문에 삼국군사동맹으로도 불린다. 삼국이 공산주의에 공동 대응하자는 방공(防共)협정(1937년)을 군사동맹으로 끌어올린 이유는 서로 ‘제2전선’을 원했기 때문이다. 히틀러는 일본이 시베리아를 공격하기를, 일본은 독일이 미국을 견제해주기를 바랐다. 독일과 일본의 계산은 바로 어긋났다. 두 가지 요인에서다. 짧게는 석유, 근본적으로는 경제력이 승패를 갈랐다. 인공석유를 생산해 석유 수요의 절반 이상을 충당한 독일은 계획대로 밀고 나갔지만 일본은 미국의 석유금수로 장비 가동이 어려워지자 시베리아 대신 보르네오 유전을 차지하기 위해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참전을 결정한 미국의 경제력은 흐름을 바꿨다. 자본의 힘은 통계가 말해준다. 1939년 주축국의 국내총생산(GDPㆍ1990년 가치로 환산)은 5,590억달러. 영국과 프랑스의 4,860억달러를 웃돌았다. 일본이 가세하고 프랑스가 점령된 1940년 주축국의 GDP는 9,170억달러로 외롭게 남은 영국(3,170억 달러)을 압도했다. 주축국의 전성기다. 미국과 소련의 참전 다음해인 1942년, 양 진영의 GDP는 1조8,620억달러 대 9,020억달러로 역전돼 종전시에는 2조4,340억달러 대 4,660억달러로 벌어졌다. 자본력의 추이와 전쟁의 양상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셈이다. 베트남 같은 예외가 있지만 경제력 없는 전쟁의 종말은 패망으로 귀착된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2,400여년 전 필로폰네소스전쟁사에 이런 구절을 남겼다. ‘전쟁의 흐름은 축적된 자본의 힘이 결정한다.’ 입력시간 : 2006/09/26 17:25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