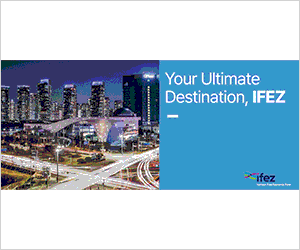역대 경제부총리들은 취임 이후 주요 그룹사를 두루 방문해 업계 현안을 논의해왔다. 김 부총리 역시 LG·현대자동차·SK 총수들과 만나 투자확대와 고용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만 빠졌을 뿐이다. 누가 봐도 이상하고 어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삼성과 관련해서는 방문시기나 방식을 놓고 이런저런 뒷말이 나온다. 재계 일각에서는 최근 정부 부처의 ‘삼성 때리기’로 민감해진 분위기가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어쩌다 경제수장이 기업 한 곳을 방문하는 과정이 이렇게 복잡하고 불편해졌는지 한숨이 절로 나온다.
정부 당국자와 산업계의 만남은 잦을수록 좋다.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합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불거져 나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논란만 해도 그렇다. 공장을 짓고 제품을 내놓는 데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소요되는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외면한 채 기존 산업군의 잣대로만 재단하는 바람에 과도한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당국이 좀 더 일찍 바이오 업계와 소통해 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더라면 사태가 이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책당국과 기업인이 자주 만나 머리를 맞대고 경제 활성화를 고민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불편한 관계에 머무른다면 일자리도, 혁신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운 법이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에 동참할 수 있다면 어느 기업이든 만나 힘을 합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김 부총리가 경제 살리기라는 목표만 보고 가겠다면 산업현장 방문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