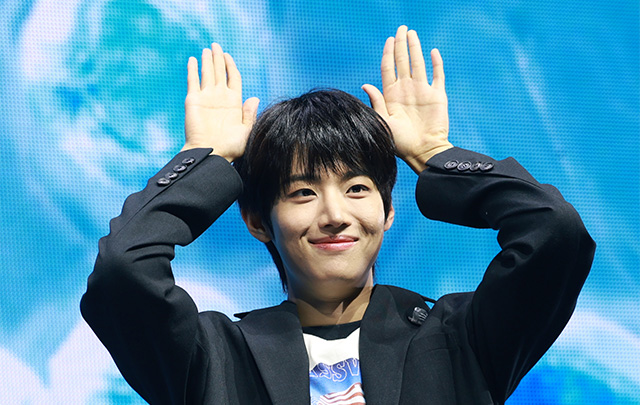“지휘자는 정년이 없어요. 하지만 젊은 지휘자가 더 주목을 받기 마련이죠. 매번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올해 국내 무대 데뷔 15년을 맞은 ‘마에스트라’ 여자경(52·사진)의 시간은 새롭게 흐른다. 가장 달라진 점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바라보는 시야다. 그는 “30~40대 때는 오케스트라에서 제 역할을 못하거나 삐딱한 태도를 보이는 단원이 눈에 거슬리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사랑을 담아 쳐다보게 됐다”며 “잘 안 보이더라도 저마다 장점이 있고 이를 200% 끌어올려 주는 게 지휘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대전시립교향악단의 상임 지휘자로 선임된 뒤 일 년을 맞았다. 임기 초기부터 강조했던 것은 ‘서로 듣는 앙상블’이다. 오케스트라의 첫 번째 덕목이기도 하지만 이를 잘 해내는 것도 쉽지 않다. 사실 단원들도 직장인이다. 누구나 빨리 퇴근하고 싶고 연 100회 이상 공연을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다. 여 지휘자는 “악장·수석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리허설 시간이 귀하다는 생각을 한다”며 “최대한 모두와 한 번 이상 눈을 맞추고 저마다 필요한 디렉션을 받아갈 수 있게 노력한다”고 말했다. 사실 연주자들은 말을 안 할 뿐 지휘자가 걸어 들어오는 것만 봐도 어떤 지휘를 할지 다 안다는 것.
지휘자는 때가 되면 떠나는 보따리장수일 뿐 지휘자가 떠나도 ‘지휘자를 많이 타지 않는’ 오케스트라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는 “씨실과 날실이 잘 짜여 있으면 크게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내실을 다지는 게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
여 지휘자는 다음 달 29일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는 ‘피아니스트 임동혁 초청 음악회’에서 트리니티 오케스트라를 이끌며 임동혁과의 협연을 지휘한다. 여 지휘자는 “그간 신기하게도 임동혁과는 같이 할 기회가 없었기에 더 기대가 된다”며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연주할 차이콥스키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에서 유학 중이던 2005년 수원 국제 지휘 콩쿠르 결선에 나가기 위해 출산 예정일을 2주 남짓 앞두고 서약서까지 쓴 뒤 비행기를 탔다. 예정일이 코 앞이었지만 50kg가 채 안 됐던 자그마한 체구의 지휘자는 커다란 배를 한 손으로 받쳐든 채 절박하지만 즐겁게 지휘를 했다. 그때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오겠어.’ 당시 예정일까지 잘 버텨 준 딸은 이제는 쉴 틈 없이 지휘 공부를 하는 엄마를 보면서 말한다. “엄마는 ‘갓생’ 사네.”
피아노·오르간·첼로 등 고루 악기를 잘 다루고 듣는 귀도 좋으니 지휘를 시작해보라는 한 교수의 추천으로 무작정 도전한 지휘자의 삶이다. 당시 한양대에는 지휘과가 없어 여 지휘자의 대학원 입학과 동시에 교수들이 머리를 맞대 커리큘럼을 개발했다. 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학생 하나를 앉혀두고 이것저것 시도를 한 끝에 1호 졸업생이 나왔다. 그는 “작곡으로 시작해 이런저런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게 큰 마중물이 됐다”며 “많은 음악가들을 만날 수 있고 마음도 읽고 역량만 되면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이 역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여 지휘자는 최근 이승원 지휘자의 말코 국제 지휘 콩쿠르 우승과 관련해 “뛰어난 연주자가 많아지는 동시에 이를 이끌 좋은 지휘자들이 늘어나는 것 역시 바람직한 변화”라며 축하를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adein@sedaily.com
made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