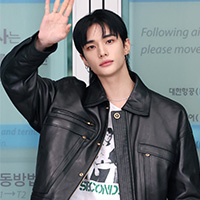우리 산업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재해가 끊이지 않는다. 많은 사람은 ‘또 사고가 났구나’ 하고 무심히 지나치기 쉽지만 산업재해는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일터에서 발생하는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교훈을 얻어 재발을 막아야 한다. 사고 조사는 단순히 책임을 가리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다.
사고는 단순히 한 가지 실수나 부주의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직접 원인 외에도 여러 간접 요인이 얽혀 사고가 발생한다. 직접 원인은 비교적 쉽게 드러난다. 하지만 간접 요인은 사고 발생이 가능하게 만든 배경 요인으로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다.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찰스 페로 미국 예일대 교수가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를 계기로 제시한 ‘정상 사고’ 이론이 이를 잘 설명한다. 현대사회의 사고와 재난은 큰 실수 한 가지가 아니라 사소한 문제들이 긴밀히 상호 작용하며 발생한다. 작은 결함이 중첩되고 얽히면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예방은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안전보건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이 대표적인 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계획-실행-점검-조치’의 PDCA(Plan-Do-Check-Action) 사이클을 통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 관리하고 통제하는 효과적인 장치다.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조직 문화 전반에 안전보건을 뿌리내리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일부 기업들은 이 법을 ‘처벌법’으로 인식해 불안과 부담을 호소하지만 법의 본질은 예방이다. 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곧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사이클과 비슷하다. 따라서 처벌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최후의 수단일 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령임이 분명해진다. 안전보건의 시스템적 접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경영진 리더십과 노동자 참여가 조화를 이룰 때 현장의 안전보건은 제대로 작동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매우 의미가 크다. 노동자를 ‘보호의 객체’에서 ‘예방의 주체’로 전환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 안전보건 조치는 실효성을 갖게 되고 그만큼 산재 예방의 성과도 커질 것이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산재 예방이 노동자만이 아니라 경영자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우리 사회 모두가 기대해볼 만한 변화다.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기업 생산성과 사회 신뢰를 높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다. 원인을 찾아 개선하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체계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강조하는 것처럼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 노동자의 주체적 참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함께할 때 안전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자리매김한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강조하는 것도 결국 같은 메시지다. 궁극적으로 일터의 안전을 지키는 길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