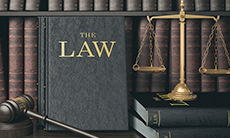최근 대법원의 격일제 근로자 주휴수당 판결을 두고 ‘격일제 근무하면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해야 한다’는 오해 소지가 있는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이 해석에 따라 격일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절반만 지급한 사업주는 자칫 임금체불 사업주가 될 수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 8월 대법원은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에서 일하는 격일제 근로자가 받아야 할 주휴수당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의 핵심은 격일제 근로자처럼 소정근로일이 1주 5일 미만인 근로자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나눠 계산하면 된다’고 제시한 점이다. 이 계산법이 없으면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이 더 많은 근로자보다 주휴수당을 더 받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1주 5일 일하는 근로자와 8시간씩 1주 4일 일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이 8시간으로 같아지는 것이다. 대법원이 제시한 계산법은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과도 일치한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사건을 처리할 때도 대법원처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계산해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주휴수당 계산 법리는 감독과 행정에서 쓰고 있었던 비례 계산식과 같다”고 말했다.
판결을 이끈 사례 탓에 ‘격일제 근무하면 (8시간) 주휴수당도 절반(4.75시간)만 지급한다’는 식의 해석이 나와 우려된다. 이 사건에서 격일제 근로자는 자신들의 유급 주휴시간(주휴수당 기준)을 다른 고용형태 근로자들처럼 8시간으로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은 달랐다. 대법에 따르면 이들은 하루 8시간씩 1~11개월은 13일을, 나머지 1개월은 12일을 일했다. 이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23.78시간이다. 이를 다시 5일로 나누면 4.75시간이다. 대법원은 최종 4.75시간을 유급 주휴시간으로 판단했다.
이처럼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절반’은 이 사건에서 격일제 근로자가 하루 8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우연히 도출된 결과다.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3일 근무하는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은 3시간(15시간/5일)이다. 반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3시간인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은 6.6시간이다. 두 상황 모두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의 절반’이라는 해석과 어긋난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주휴수당이 부담이라고 호소해 온 현장에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무사는 “노동부 행정 해석과 달리 격일제 근로자에게 하루 근무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준 사업장도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격일제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절반이라고 오해할 사업장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바꿀 행정 해석은 현재로선 없다”며 “기존처럼 격일제 근무자의 주휴수당을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된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gm11@sedaily.com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