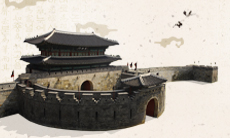이번 정상화 방안이 민간 출자회사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4월1일 이사회 개최 이전까지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 벌써부터 민간 출자회사들은 파산 위협을 무기로 백기투항하라는 최후통첩이라며 반발하는 모양이다. 코레일이 주도하는 용산개발이 실패할 경우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말라는 방안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다. 최대 난제인 신규 자금조달 방안도 막연하기만 하다.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2조원대 빚은 어떻게든 막는다지만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 모르겠다.
용산개발이 정상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새 판을 짜야 한다. 하지만 용산개발 새 판 짜기에는 원칙부터 재정립해야 한다. 이번 방안의 실효성은 차치하고 철도운영을 전담하는 공기업이 31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맡는 것이 온당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용산개발 실패의 책임이 가장 큰 1대주주이다. 전문성이 있는 공기업도 아니다. 자칫 실패라도 하다가는 혈세를 축낼 우려도 감안해야 한다.
물론 파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 코레일 주도로 사업구도를 재편하는 게 그나마 낫다는 현실론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철도공기업이 부동산 개발에 나서는 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수긍할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파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파장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용산개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출구전략의 첫걸음은 코레일의 역할부터 냉정하고 엄격한 잣대로 재검토하는 일이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