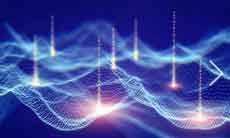과잉진료는 동네 의원은 물론이고 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에 이르기까지 만연된 상황이다. 진료과목도 치과·내과·외과·성형외과 등으로 총망라돼 있다. 대다수 의료기관이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삼아 불필요한 진료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올 3월 암 전문의들이 "득보다 해가 많은 갑상선암 과다진단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겠는가.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4월 무분별한 성형수술로 인한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과잉진료가 난무하는 것은 상업화된 의료 시스템 탓이 크다. 소형 병원은 차치하고라도 지방의료원이나 국립대병원마저 매출을 늘리는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현실이다. 의사들이 환자에게 검사 하나라도 더 받게 하려고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과잉진료의 폐해는 한둘이 아니다. 건강보험재정과 환자들의 주머니를 홀쭉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
불필요한 진료 논란이 큰 갑상선암의 경우 수술을 한번 받으면 평생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한다. 아픈 사람을 구한다는 의술이 되레 환자를 양산하는 셈이니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비양심적인 의료기관을 색출해야 한다. 빈번하게 과잉진료를 일삼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 삭감, 병원 인증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