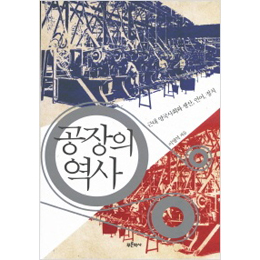|
'공장'이라는 주제를 통해 영국 경제사를 들여다본 책이다.
19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사회사와 노동사, 생활사 및 사학사 분야의 논문 80여 편을 펴낸 저자가 엮은 책이니만큼 깊이와 통찰력이 묻어난다.
디지털 혁명이라는 말이 더 익숙한 21세기에 '공장'이라는 주제는 새삼스러울 수도 있다. 근래 산업혁명을 획기적인 대변화가 아닌 점진적 변화로 파악하는 수정주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면서 공장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기 때문. 그러나 '거대한 공장'들을 토대로 사회 변혁을 이룬 20세기 산업화는 한 사회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는 동력으로 작용했음에는 틀림없다. 나아가 현대 복지국가모델 역시 거대공장에서 정립된 노사관계의 역학을 사회 전체로 확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20세기 자본주의를 좀 더 깊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이 책에는 '포디즘'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자동차 생산 공장의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에서 유래한 것으로 조립라인 및 연속공정 기술을 이용한'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축적체제'를 일컫는 말이다. 1890년대 이래 미국의 거대기업들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공정별 기계화, 생산과정에 대한 경영자 통제, 생산 활동을 일관성 있게 통제하는 위계적 조직의 구축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그 후 자동차, 전화와 같은 내구소비재 산업에서 이러한 생산 원리는 개별 작업의 '기계화'를 통한 부품 표준화로 변용돼 '포디즘 체제'를 낳았다. 이 책은 이 같은 '포디즘'체제가 어떻게 등장하고 정립 됐는지는 물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영국의 특수성'을 살피기도 한다. 동시에 포디즘에 대한 지식인들의 담론과 비판도 담았다.
산업화는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줬지만 자원 고갈, 지구 생태환경의 악화 등 여러 부정적 면모를 남겼다는 것. 결국 유럽 여러 나라에서 장인생산의 전통은 급속하게 무너지고, 생산의 주체는 기계, 인간은 그 보조적인 지위로 떨어지게 된 현실을 꼬집는다.
저자는 책의 마지막 장인 '탈공장의 시대와 인간 노동'에서 탈공장 시대에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를 던지며 책을 마무리한다. 저자는"우리가 다시 성찰해야 할 것은, 인간 노동이 이전과 같은 노역의 형태가 아니면서도 기계와 '함께'연결되는 방식의 재현"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인간의 주체적 사유와 판단이 기계의 움직임을 이끌어가고 생산 과정 전체에 인간의 의식과 활동을 더 중시하는'포스트포디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2만 8,500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