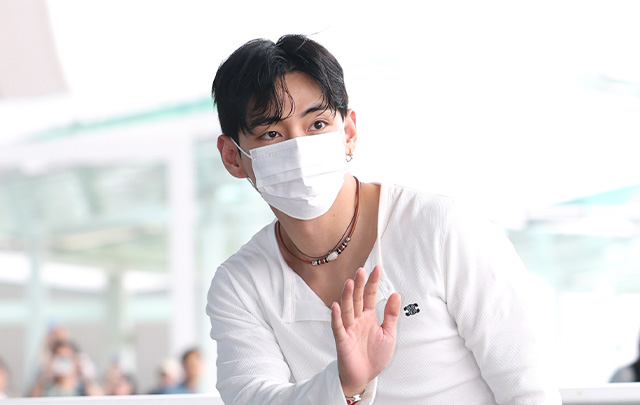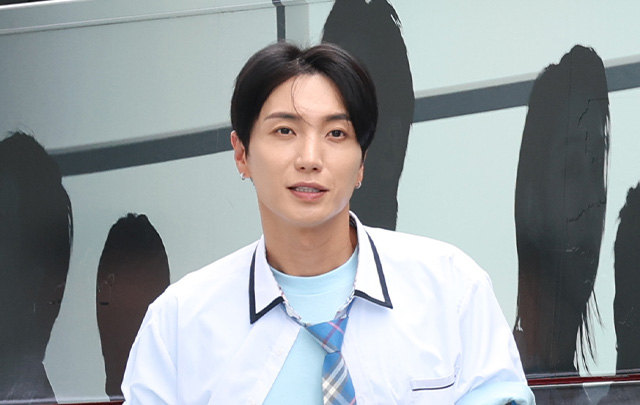|
지난 3월 교육방송(EBS)에서 마이클 샌들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강의를 편집한 '정의란 무엇인가'를 보면서 '이제 대학의 강의는 더 이상 캠퍼스 내 대학생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샌들 교수의 강의는 하버드대라는 프리미엄이 크게 작용하기는 했지만 학생들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며 지식을 쌓아가는 교수법이 돋보였다. TV를 시청하는 우리도 마치 그 강의실에 함께 있는 듯 빨아들이는 흡입력 덕분에 다소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 그의 강의는 지상파 방송은 물론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 지하철ㆍ카페 등에서 다시 들을 수 있는 인기 동영상 콘텐츠가 되기도 했다. MIT 강의 접속자 한국이 4위 대학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강의를 공개해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개발 국가의 국민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나누자는 운동은 지난 2002년 유네스코에서부터 시작됐다. 대표적 사례가 대학 강의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오픈 코스웨어(Open CourseWare)'다. 최근에는 MITㆍ하버드ㆍ스탠포드 등 세계적인 명문대학 대부분이 오픈 코스웨어 운동에 참여, 경쟁이라도 하듯 강의를 공개해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서 손쉽게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MITㆍ하버드는 강의뿐 아니라 교수들의 논문도 공개해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운동에도 적극적이다. 지식이 곧 재화가 되는 지식사회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지적자산을 그렇게 쉽게 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자는 기부문화가 성숙한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고 혹자는 유명 교수가 지적재산권을 포기하면 짧게 보면 손해 보는 듯하지만 멀리 내다보면 연구실적이 공개되면서 명성이 더 올라가 몇 배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도 한다. 그렇다면 세계적 흐름을 앞서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대학들은 아직 정규 강의를 공개하는 일에 극히 소극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출연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대학정보 공시 항목의 하나로 각 대학이 공개한 강의 현황을 보면 지식기부 차원에서 공개한 강의는 거의 없다. 교과부의 재정지원 사업으로 이뤄진 강의로 실적을 채우는 정도다. 강의 공개를 꺼리는 원인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큰 원인은 수업에 사용되는 타인의 저작물 사용에 대한 저작권 관련 부담이며 두 번째는 교육보다 연구업적 중심인 우리 대학의 평가제도 탓이며 세 번째는 강의의 질에 대한 개인적 부담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대학 교수들도 분발해야 대학교육 경쟁력의 핵심은 강의의 우수성이다. MIT가 오픈 코스웨어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접속자수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큰 일반인(43%)이 학생(42%)을 앞질렀다. 접속 지역을 알아볼 수 있는 도메인을 분석해보니 우리나라 대학들이 미국ㆍ중국ㆍ인도에 이어 네 번째로 접속을 많이 했다. 인구나 언어까지 고려한다면 우리 대학생들이 MIT 오픈 코스웨어에 가장 많이 접속한 셈이다. 세계를 향한 우리 학생들의 이처럼 뜨거운 지식욕구는 미래를 밝게 해주는 희망이다. 하루빨리 캠퍼스 안에서 잠자고 있는 우리 교수들의 훌륭한 강의가 많이 공개돼 대학생은 물론 직무능력ㆍ지식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직장인, 고령화로 생이 늘어나면서 배움에 목말라하는 많은 중장년 층의 평생교육을 위한 '지식의 샘'이 돼주기를 희망한다. 나아가 미국ㆍ영국 등의 교육방송에서 우리 대학의 유명 강의가 인기리에 방송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