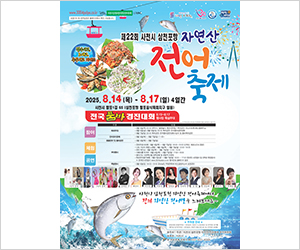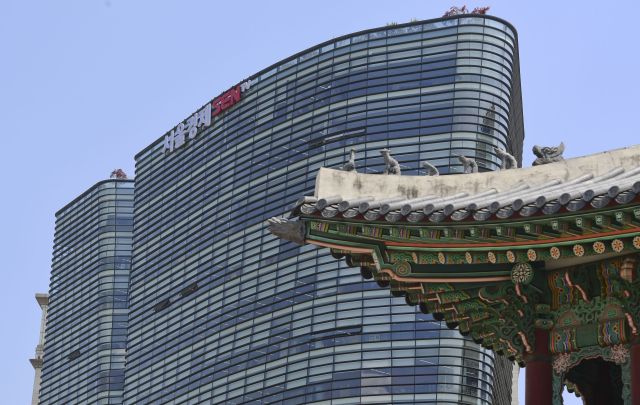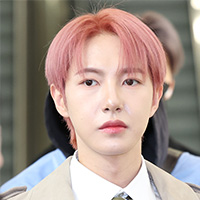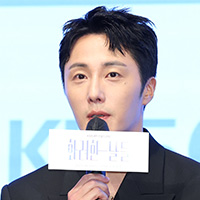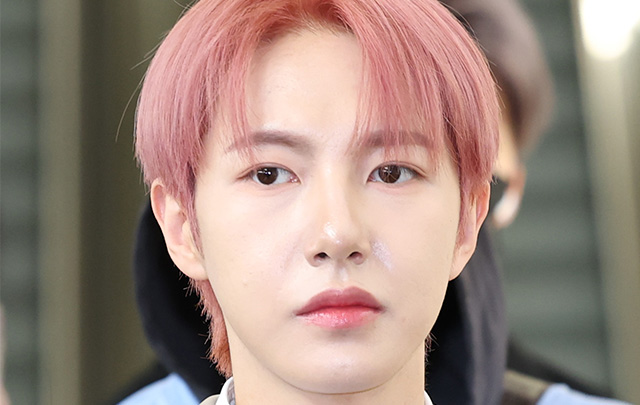인류 역사상 가장 소중한 자산을 하나 꼽으라면 무엇일까. 답은 인간 그 자체가 아닐까.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국가나 기업도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지 않는가. 생존 투쟁이 보다 극명하게 갈렸던 고대나 유목민 사회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욱 강했다. 로마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출산 포기는 살인에 버금가는 중죄’라며 기원전 18년 ‘혼인법’을 제정해 결혼적령기를 벗어난 총각들에게 세금을 매겼다.
유목민들은 아예 가임 여성을 그냥 두지 않았다. 거친 환경에서 부족의 노동력과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구려의 형사취수제(兄死娶嫂制)처럼 가임여성을 홀로 두지 않았다. 세계를 정복한 몽골의 영웅 칭기즈칸은 아내 부르테가 납치된 후 낳은 아들 주치를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며 장남으로 삼았다. 아내를 사랑하기도 했거니와 임신과 출산에 부족의 미래를 걸었던 유목사회의 생존원칙을 중시했기 때문이 아닐까.
고대 이스라엘에서 독신자는 인간 이하 취급을 받았다. 로마와 유대전쟁에서 패한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후 세월을 두고 확정됐다는 유대인의 정체성(identity) 원칙도 같은 맥락이다. 유대인사회에서 유대인이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종족과 혈통에 관계없이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인식해 율법을 따르거나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도 유대인이라고 여겼다. 오랜 방랑을 거치는 동안 부계 중심의 승계가 이어질 경우 유대인 사회의 존속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종족 유지의 당위성은 동서고금이 마찬가지다. 거대한 스페인 제국의 압제에 맞서 80년 독립전쟁을 벌였던 네덜란드는 미혼 가임여성에게 미혼세를 거뒀다. 이탈리아 베니토 무솔리니도 미혼세를 거뒀다. 구소련은 아이가 없는 사람에게 임금의 6%를 떼어가는 미출산세를 1941년 제정해 소연방 해체(1990)까지 유지했다. 미혼세는 중세나 파시스트 전제국가, 또는 공산주의의 전유물이었을까.
미국 중서부 미조리주는 1820년12월20일, 미혼세 법령을 채택하며 21세 이상 50세 이하 남성이 결혼하지 않는 경우 매년 1달러씩 미혼세를 매겼다. 노예주로 남게 된 미주리 타협 이후 백인 남성의 수를 늘려 중앙 정치무대에서 주(州)의 발언권을 유지, 강화를 위한 고육책. 인근 주들도 잇따라 미혼세를 도입하거나 미혼벌금을 부과하고 나섰다.
가장 적극적으로 인구 증가 시책을 펼치고 성공한 국가는 프로이센. 18~19세기 프로이센 급성장의 비결도 인구에 있다. 나폴레옹이 천재 전략가라고 극찬했던 프리드리히 1세부터 그의 아들 프리드리히 빌헬름 치세까지 프로이센은 출산장려는 물론 남자들의 수도원행을 막고 상대가 과부인 경우에 한해 중혼까지 허용하는 성개방 정책으로 불과 50년 만에 인구를 두 배로 늘렸다. 불어난 인구로 군대를 증강한 프로이센의 힘이 없었다면 330여개로 갈라졌던 독일의 통일이 보다 늦춰졌는지도 모른다.
오늘날의 한국의 인구 문제는 그 어떤 시기, 어느 사회보다 엄중하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둘만 낳아 잘 기르자’에서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며 강력한 인구 증가 억제책을 펼친 게 엊그제 같은데 인구 절벽에 맞닿았다. 출산율이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한 경제도 후퇴 일로를 걷게 돼 있다. 오는 2029년부터는 항구적이고 급속한 마이너스 성장, 즉 급격한 인구 감소가 불가피하다. 2500년이면 민족이 소멸한다는 끔찍한 예측도 있다.
정작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는 결혼과 출산, 육아를 두려워한다. 당연하다.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20대 초반의 5분의 1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우울한 소식까지 들린다. 당국도 걱정했는지 ‘싱글세(single tax)’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론과 젊은 층의 십자포화를 맞은 적도 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을 미래를 위해 투자할 때다.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결혼과 출산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
프로이센의 인구 급증기는 경제 성장기와 일치한다. 경제성장률을 급격하게 끌어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답은 ‘선택과 집중’ 밖에는 없다. 징벌적 미혼세나 벌금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이 효과적이다. 프랑스의 성공적인 출산장려책이 말해주는 교훈은 자명하다. 징벌보다는 장려책이 효과적이다. 재원이 없다면 노년층에 돌아갈 복지를 줄여서라도 출산율 제고에 전력투구할 때다. ‘5060세대가 물러나 2030세대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서울대 사회학과 송호근 교수의 주장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의 장래는 없다.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hong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