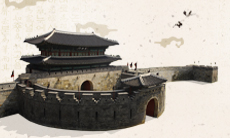내년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받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받아야 한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확보해야 합법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상황에서 은행이 사실상 사업자의 ‘생존’을 쥔 셈이다. 업계는 은행의 자의적인 평가로 가상자산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시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가 골자다.
이번 시행령은 특금법의 후속조치로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 영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모두 특금법 적용을 받도록 구체화했다. 또 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가상자산의 범위에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은 제외했다.
업계가 시행령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발급 기준이다.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이 범죄 집단의 자금세탁 용도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에 실명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통해 실명 계정을 발급받기 위한 다섯 가지 조건을 명시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 예치금, 거래내역을 분리·보관해야 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사업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직권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등에 해당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이 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금융회사가 사업자의 시스템, 업무지침을 확인해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실명 계정의 발급을 은행으로 제한하되 향후 다른 금융사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업계는 이 조항에 우려가 크다. 현재도 은행이 자의적 기준에 따라 실명 계정 발급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금법이 시행되면 이 같은 경향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지금도 은행에서 실명 계정을 발급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이 있다”며 “객관적 기준 내지 절차를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면 은행이 실명 계정을 발급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은행 역시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관리 의무가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문제가 생길 경우 은행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관리 책임을 은행에 부여하는 당국의 지침 이후 은행들이 사모펀드 수탁을 거부하고 있지 않냐”며 “가상자산 업계도 마찬가지로 은행이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들여다보면 관련 비용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우려에도 금융위는 은행의 정성평가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고객을 확인하는 의무로 은행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다”라며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ikim@sedaily.com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