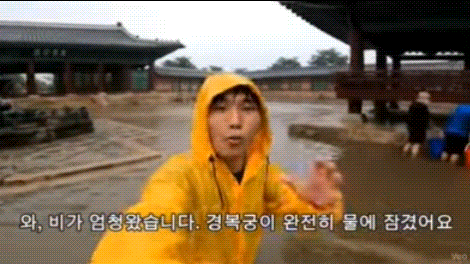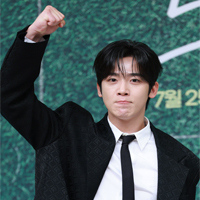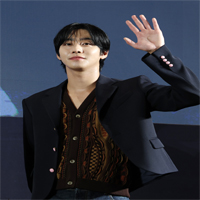‘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를 부르는 또 다른 별칭이다. 조선 시대 임금 바로 아래에서 조정의 신하와 지방관리들을 다스렸던 영의정처럼 국무총리는 대통령 궐위 시 그 직위와 권한을 대행하는 명실상부한 국정 ‘2인자’다. 하지만 수많은 전·현직 총리들이 끝내 이루지 못한 꿈이 하나 있다. 바로 ‘대권’이다. 정통관료와 정치인 출신 총리들이 앞다퉈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모두 대권과는 인연이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총리 출신 대권 주자의 대망론이 떠오르고 있다. 무려 두 번의 총리 경험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인공이다. 한 총리는 2일 공직에서 사퇴한 뒤 이튿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보수진영은 한 전 총리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으로 끝날뻔한 6·3 대선의 판도를 뒤흔들 ‘이재명 대항마’로 주목하고 있다. 대권 도전에 나선 한 전 총리가 역대 국무총리들의 대권 도전 잔혹사를 끊어내고 국민이 직접 뽑은 사상 첫 총리 출신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시장·檢총장도 했지만…총리만 허락되지 않은 자리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통할하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2인자’다. 하지만 유독 총리 출신은 대통령 자리와는 인연이 없었다. 역대 13명의 대통령 가운데 총리 출신 대통령은 간선제로 선출된 최규하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최 전 대통령은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서거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대통령에 선출됐다. 다만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은 아니었다.
이후에도 숱한 국무총리들이 대권 주자에 이름을 올렸지만 번번이 좌절했다. 가장 대표적 인물 중 하나는 고 김종필 전 총리다. ‘3김시대’의 주역인 김 전 총리는 충청권 맹주로 9선 의원까지 지냈지만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과 달리 청와대 문턱은 넘지 못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 ‘대쪽 총리’로 이름을 알린 대법관 출신의 이회창 전 총리도 1997년과 2002년 연달아 보수정당 후보로 대권에 도전했지만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벽을 넘지 못했다.
문민정부에 이어 참여정부에서도 국무총리를 역임한 고건 전 총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안정적인 국정운영으로 일약 대권 주자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당시 노 대통령이 고 전 총리를 ‘실패한 인사’라고 규정한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야권 주자로 급부상하면서 대선 출마를 포기했다.
대선 두달 남기고 불출마 황교안, 두번째 대권 도전
참여정부에서 나란히 총리를 지낸 이해찬·한명숙 전 총리도 대권 도전을 꿈꿨지만 당내 경선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총리를 지냈던 서울대 총장 출신 정운찬 전 총리도 2017년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가 완주하지 못한 채 중도 낙마했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올랐던 황교안 전 총리는 궤멸 위기에 놓인 보수진영을 구할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조기 대선을 55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황 전 총리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패배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무소속 출마했지만 당선권과는 거리가 멀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란히 총리를 역임한 정치인 출신의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총리도 대권 도전을 꿈꿨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정권 ‘2인자’ 한계론…네거티브 공세 취약점 노출도
인권 변호사, 서울시장, 검찰총장도 올랐던 대통령 권좌가 유독 총리 출신 인사들에게만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내기보다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충실한 국무총리의 특성상 ‘2인자’ 낙인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더욱이 ‘정권심판론’ 성격이 강한 대선일수록 현 정권에서 총리를 지낸 대권 주자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한국 정치체제에서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2인자’라는 프레임을 극복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더욱이 대통령과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다 보니 국민들은 스스로 국정운영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마련”이라고 진단했다.
정통관료 출신 총리의 경우 ‘대선 무대’라는 링 위에 오르는 순간 경쟁자들의 집중포화 공세에 대한 방어력이 취약한 점도 한계로 꼽힌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안전한 온실 속 화초로 자라온 관료 출신 인사들은 정치판이라는 들판으로 나오는 순간 본인은 물론 가족을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공세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맷집이 없다면 대권 주자로 버티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실제 직업 외교관 출신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017년 탄핵 정국 당시 보수진영의 대안 카드로 급부상했지만 자금난과 정치경험 부족 등 스스로 한계를 드러내며 대권 도전 20일 만에 낙마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칼은 칼집 속에 있을 때 가장 무서운 법”이라며 “한 총리가 대선 무대에 등판해 경쟁 주자들의 집중 견제를 받으면 약점이 노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거야 공세에 맷집 세져…선거는 훈련 아닌 실전
다만 두 번의 총리와 경제부총리, 주미대사 등 국내외에서 모두 잔뼈가 굵은 한 전 총리를 반 전 총장 사례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 교수는 “직업 외교관 특성상 해외근무 경험이 많아 국내 사정에 어두웠던 반 전 총장과는 달리 한 전 총리는 국내에서의 오랜 관료 생활로 내치 경험이 풍부하다”며 “다만 선거는 도상훈련이 아닌 실전인데 관련 경험이 전무한 한 전 총리가 선거 베테랑들과의 경합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결국은 본인의 역량에 달려 있는 것”이라며 “한 전 총리의 경우 수차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맞서는 맷집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덕수 대망론’을 주창해온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총리가 국회에서 얼마나 야당한테 두드려 맞았냐”며 “한 전 총리도 맷집이 생기면서 아주 강해졌다”고 치켜세웠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im0123@sedaily.com
kim012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