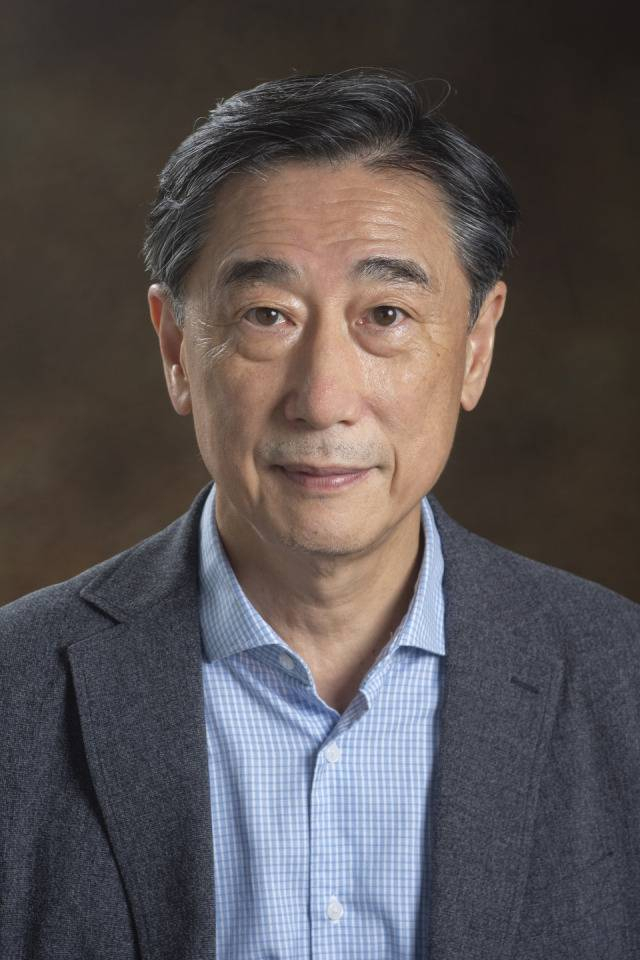노화와 죽음은 가장 효과적인 이퀄라이저(equalizer·균형추)다. 누구나 늙어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생명이 끝난다. 치열한 삶의 경쟁 속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취한 것이 자랑스러워 영원히 보존하고 싶은 사람 모두 유한한 생명 앞에 평등해진다. 자기 이름을 역사에 남기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사후의 영혼과 부활의 존재를 믿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개인적 철학·종교 영역에 속한다.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사회 구성원이 태어나고 죽는 양 시점 사이에서 행복하게 살고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960년 52세에 불과했던 평균수명은 이제 90세에 가까워졌다. 반면에 출생률은 0.7명대로 최저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 고령화 진행 속도와 출생 감소 속도 모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올해부터 20%를 넘어서고 이렇게 가면 앞으로 한 세대 후 노인 인구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이런 현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우리 사회의 건강함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집단적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산 장려책, 정년 연장, 사회보장 강화, 외국 인력 수입 등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아이를 많이 낳고 잘 키워서 사회를 젊게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라는 현실에 적응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고령인구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그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아동을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와 보호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성인과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봐야 하듯 노인도 사회에서 퇴장해 여생을 정리하는 대상으로만 보면 안 된다. 그들이 사회에서 적절한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고령화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 못지않게 또는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적지 않다. 순발력보다는 신중함이 요구되고 도전 정신보다는 경험이 중요한 일들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감수성이 저하된다. 신체의 모든 기능이 떨어지니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도 쇠퇴하는 게 당연하다. 당사자로서는 서글픈 일이지만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면도 있다. 무뎌진 감각으로 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이성이 감성의 지배를 벗어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도 된다. 젊은 시절에는 감성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만 접근하기 어려웠던 일들도 보다 쉽게 가능해질 수 있다. 감성보다 이성이 더 요구되는 분야는 물론 감성이 필요한 경우에도 절제의 미덕을 발휘해 감성을 승화시킴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와 같이 노인을 공경하던 유교적 가치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의 삶의 한 단계로서 고령층이 갖고 있는 장단점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역할은 평등한 사회에서도 있는 그대로 존중돼야 한다. 평균수명이 40세가 되지 않던 때 소크라테스는 71세까지 활동했고 미켈란젤로는 88세의 나이로 별세하기 1주일 전까지 ‘피에타’ 조각상을 만들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700년 전 72세까지 현역이었던 최영 장군이 있었다. 이들이 모두 노년에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특출나서라기보다 자신들이 잘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