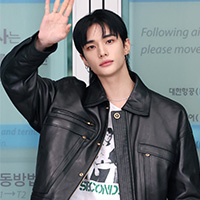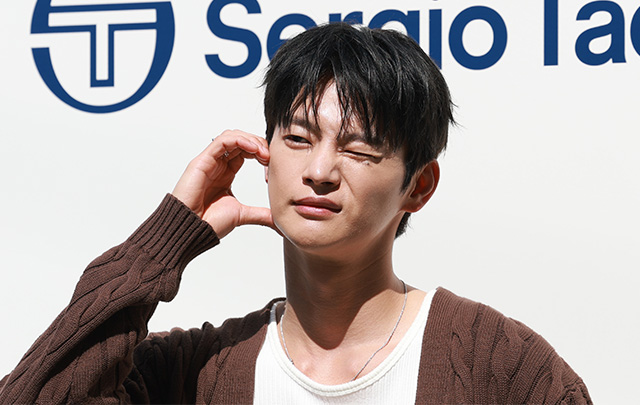2020년은 한국 영화사에서 잊을 수 없는 해다.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하며 K무비의 저력을 입증했다. 작품성에 보다 집중하는 다른 영화제와 달리 아카데미상 수상은 글로벌 시장 흥행 가능성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영화사에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그런데 K무비의 위상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0년 암흑기가 시작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팬데믹 기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극장을 빠르게 대체했다. 2023년 엔데믹 이후에도 OTT에 익숙해진 관객들은 극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연 2억 명이 넘던 극장 관객은 반 토막이 났다. 올해는 연 1억 명이 붕괴되고 2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시장이 위축되면 작품 수도, 좋은 작품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해마다 칸국제영화제에 다수의 한국 영화가 진출했지만 올해는 단편 애니메이션 한 편만이 후보에 올랐다. ‘기생충’이 개봉했던 2019년 극장 관객은 2억 2667만 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호황이었다. 호황에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것을 증명하듯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올해 토니상 작품상 등 6개 부문을 석권했다. 엔데믹 이후 뮤지컬은 영화와 달리 최고 호황을 맞았다.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공언한 이재명 정부는 영화 산업의 침체를 우려해 추가경정예산 271억 원을 투입해 영화관 입장권 6000원 할인권 450만 장을 지급했다. 정책의 인기와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지급 첫날 극장 앱은 마비가 됐고 쿠폰을 사용하면 영화를 1000원에 볼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에 개봉한 ‘좀비딸’은 이틀 만에 70만 명을 모아 흥행을 시작했다.
단기 처방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마저 없었다면 최대 성수기인 여름방학에도 극장은 개점휴업 상태였을지 모른다. 시장을 살리는 데는 단기와 장기 처방이 모두 필요하다.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K팝과 함께 K컬처의 핵심이었던 영화를 살릴 필요가 있다. 영화가 영상의 기본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적기에 내린 처방이 시장을 살리고 있듯 독립예술영화 지원뿐 아니라 인공지능(AI)·스크린X 등 특수관, 글로벌 배급망 지원 등 변화한 시장에 맞춘 정부의 장기 정책이 기대되는 이유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eonvic@sedaily.com
yeonv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