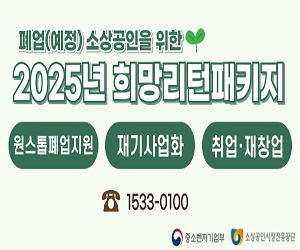1789년 프랑스 왕 루이 16세는 성직자·귀족·평민 출신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인 삼부회를 소집했다. 절대왕정 확립으로 폐쇄된 후 175년 만이었다. 루이 14·15세 시절에 벌인 수많은 전쟁과 베르사유궁전 건설, 루이 16세 시기 미국 독립전쟁 지원 등으로 나라 곳간이 극도로 나빠져 세금을 더 거둬들여야만 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절대왕정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폭발하면서 평민 대표들이 삼부회를 탈퇴하고 바스티유 감옥이 습격당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결국 국가 재정위기가 프랑스대혁명의 도화선이 된 것이다.
서로마제국의 붕괴는 귀족·교회 등에 대한 면세 특권 확대, 국경 방어 비용 증대, 현물 대신 토지 지급 등으로 국가 재정 기반이 무너진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있다. 오스만제국은 산업혁명에 뒤처진 가운데 1·2차 발칸 전쟁으로 재정이 악화된 후 국가 부도 사태까지 맞았고 이후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편에 섰다가 완전히 해체됐다. 러시아제국에서는 1차 세계대전으로 재정이 파탄 나고 물가가 폭등하면서 로마노프왕조 붕괴와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어졌다.
긴축재정을 추진해온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행정부가 하원의 불신임 결정으로 취임 9개월 만에 총사퇴하게 됐다.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지난해 약 5200조 원으로 프랑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113%에 이른다. 프랑스가 2011~2012년 유럽 재정위기를 초래한 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국가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나오면서 프랑스 국채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미국·영국 등 많은 나라들도 나랏빚에 발목이 잡히고 있어 글로벌 경제에 암초가 될 수 있다. 글로벌 경제가 어려워지면 재정이라도 튼튼해야 위기를 넘길 수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확장 정책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지금은 포퓰리즘 유혹에 빠질 게 아니라 재정위기의 역사를 돌아보며 재정 부담을 가속화할 부실 연금에 대한 구조 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 아닐까.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