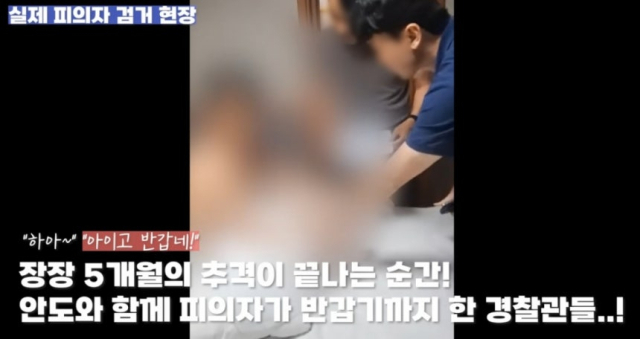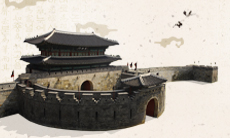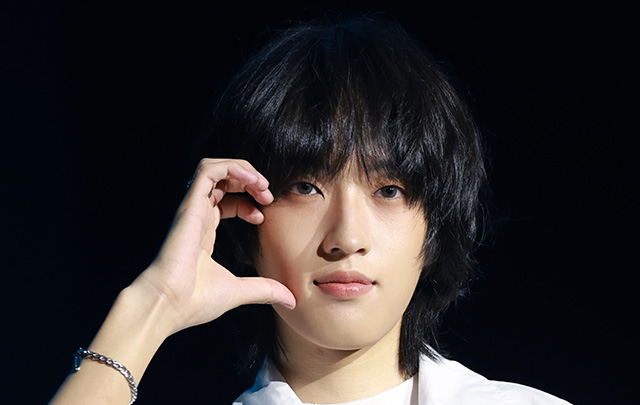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세대가 일자리도, 구직 의욕도 잃은 채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96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만 6000명 늘었지만 증가세를 견인한 것은 60세 이상 고령층(40만 1000명)이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1만 9000명이나 줄어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고용률은 15~64세 기준 69.9%로 8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청년층은 1년 전에 비해 1.6%포인트 급락한 45.1%에 그쳤다. 게다가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는 취업자 수가 10만 명 가까이 늘어난 한편으로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그냥 쉬었음’ 인구가 1만 9000명 증가한 32만 8000명에 달해 8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직에 실패한 청년층의 고용시장 소외 장기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유독 청년 세대가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은 경기 둔화로 제조·건설업 고용이 얼어붙은 데다 대기업들의 경력직 채용 선호로 대졸 신입 채용문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에 허덕이지만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으로 양극화된 노동시장에서 무작정 청년들의 등을 떠밀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경직된 고용 시스템 때문에 가뜩이나 채용을 꺼리던 기업들은 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아예 로봇·인공지능(AI)으로 비숙련 인력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와 여당은 노동 경직성을 더 악화시켜 청년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주4.5일 근무제, 정년 연장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젊은 세대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좌절하고 주저앉는다면 경제가 활력을 잃고 국가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날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제공 등 ‘쉬었음’ 청년을 지원하는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지만 일회성 금전 지원이 근본 해법이 될 수는 없다. 급변하는 취업 여건과 경직된 노동 구조에 가로막힌 청년 구직난을 해소하려면 구조 개혁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급선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