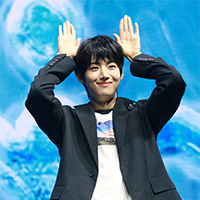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원자력발전에 공들이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다. 7월 펜실베이니아에서 개최한 에너지·혁신 서밋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인공지능(AI)·가상자산 차르가 말하기를 AI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전기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현재 사용 중인 전력의 2배는 필요하고, 아마도 그보다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는 농담 아니냐고 반문했다”며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 그 전력 수치조차 낮아서 그보다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패권을 놓고 중국과 벌이는 전쟁은 결국 전력에서 승부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달은 트럼프 대통령은 원전에 그야말로 ‘올인’했다. 5월 미국 핵에너지 산업 재활성화를 위한 4개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목표부터 규제 혁신, 인재 육성, 수출 확대까지 미국 원전 산업의 부활을 위한 계획이 망라돼 있었다. 구체적으로 5년 후인 2030년까지 미국에 10개의 대형 원자로 건설을 시작하고 현재 100기가와트(GW)인 원자력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00GW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각 부처에 신규 원자로를 승인하는 신속한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원전 건설에 가장 큰 걸림돌은 부지 선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부 장관에 모든 가용 법적 권한을 활용해 첨단 원자로의 부지 선정, 승인 및 배치를 승인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미국 내 핵연료 생산을 확대해 우라늄의 해외 의존도도 줄이기로 했고 인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핵에너지 수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중국에 이어 글로벌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한국은 정확히 반대로 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을 가동하기까지 15년이 걸리고 지을 곳도 지으려다 중단한 한 군데뿐”이라며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이 아직 안 됐다”고 평가절하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AI를 위해 원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미국과 달리 ‘탈원전 깜빡이’를 켠 것이다.
한술 더 떠 원전을 포함한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부문을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 조직 개편까지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자연스럽게 정부 에너지 정책에서 원전의 힘은 빠지고 신재생에너지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전의 평균 전력 구입 단가를 살펴보면 태양광은 킬로와트시(kWh)당 200원대, 해상풍력은 400원대, 원전 66.4원이다. AI 개발을 위해 많은 전력이 필요한 기업들은 높은 단가를 내고 전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미국 등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모 기업의 워싱턴 주재원은 “현 정부에 지분이 있는 환경 단체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 때의 탈원전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지도 얼마 안 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흐름이 있어 큰 상관은 없었다 해도 지금은 AI로 인해 모두가 원전을 지으려는 방향으로 판이 바뀌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말 일본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서 ‘원전 의존도를 낮춘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정책 U턴을 단행했고 유럽에서도 벨기에·이탈리아·스페인 등이 수십 년 만에 원전 부활을 선언했다.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주어진 경제 상황만 놓고 보면 결론은 명확하다.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100조 원을 투자하는 등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원전이 없으면 힘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원전을 향해 내달리고 있지 않은가. “신규 원전 2기와 SMR을 예정대로 건설해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소신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새길 필요가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lassic@sedaily.com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