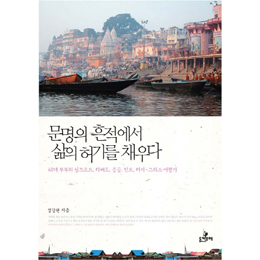|
|
끝이다 싶은 길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과 맞닿아 있기 마련이다. 바쁘게 달려온 직장생활을 마무리 하는 정년 역시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
1947년생인 저자는 증권업계에서 30여 년 일한, 우리시대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한 때는 젊은 치기로 영화감독을 꿈꾸기도 했지만 그런 바람은 마음 속에만 남았다. 여행을 좋아하긴 했지만 비행기 타는 일은 출장이 대부분이었다. 나이가 들자 그간 쌓아온 시간만큼의 '여유'가 생겼다. 60대를 앞둔 2004년부터 저자는 아내와의 여행을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 희망지로 꼽는 문명의 발생 지역 만을 택했고 그 해 실크로드로 떠났다.
둔황석굴로 향하는 길에는 난생 처음 신기루를 목격했고, '모래가 울어 산을 이루었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밍사산(鳴沙山)을 올랐을 때는 시(詩)가 절로 나왔다. 해발 2,000m의 장관이 펼쳐진 바리쿤 대초원, 전설의 누란왕국을 삼킨 쿠무타크 사막, 실크로드 교역의 요충지에 자리잡았던 교하국의 천년 영화(榮華)가 흔적 없이 사라진 교하고성을 누볐다. 치열한 삶과 그 흥망성쇠를 저자는 여정을 통해 경험하고 깨달았다.
'천상의 신이 발을 내리면 닿을 듯 높은 곳에 있는 땅' 티베트도 오랫동안 꿈꾸었던 여행지. 티베트의 수도이자 '태양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진 1,400년 역사의 문화고도 '라싸'에서는 라마불교(티베트불교)인데도 석가모니불을 모신 '조캉 사원', 라싸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인 '바코르 시장'을 다녔다. 조화와 어우러짐의 미덕을 보여주는 곳이었고 그래서 어느 사원 모퉁이에서 숨어 부르는 독립의 슬픈 노래에도 강인함을 느낄 수 있었다.
영웅 칭기즈칸을 키워낸 몽골에서는 자연 그 자체를 경험했다면 인도에서는 신들의 나라와신들의 사람들을 마주했다. 여행전문가들도 꼭 권하는 '바라나시'는 기원전 600년 경 당시 지배종교였던 브라만교에 실망한 새로운 사상가들이 갠지스 강가에 모여 토론을 벌이면서 형성된 도시다. 석가모니가 최초로 설법한 녹야원이 이곳에서 불과 30분 거리에 있는 것 또한 이 같은 배경과 관련 있다. 이 외에도 아시아의 끝이자 유럽으로 가는 길목인 터키, 비잔틴 제국과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흔적을 공유하는 천년의 고도 이스탄불, 에게해의 푸른 바다와 함께 신화가 숨쉬는 나라 그리스까지 누볐다.
저자는 독일의 작곡가인 리하르트 바그너의 "여행과 변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는 말을 늘 가슴에 새겼다. "젊은 사람들에게만 미지의 세계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하는 저자는 "더 큰 창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함으로써 인생의 황혼기를 잘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탁월한 필력이 돋보이는 책은 아니더라도 삶의 연륜이 있기에 세세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지혜와 여유가 묻어난다. 1만3,800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