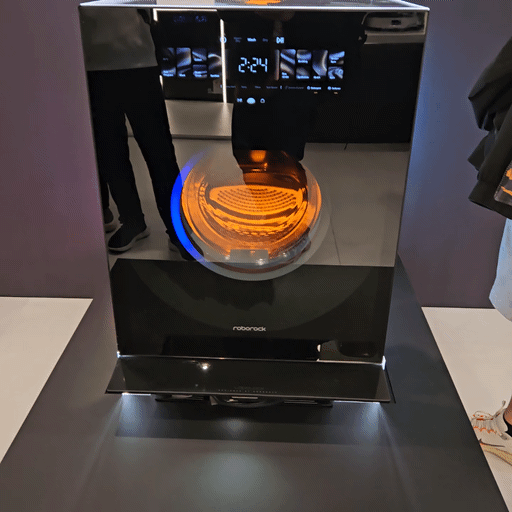|
지난해 기회가 돼 택지개발부터 준공까지의 주택공급 관련 원자료를 분석할 기회가 있었다. 2013년 말까지 취합된 자료를 분석해보고 놀란 점은 공공 및 민간을 통틀어 200만가구에 가까운 물량이 인허가 후 미착공인 채로 남아 있는 것이었다. 충격이었다. 법적으로 인허가 후 2년이 지나면 취소가 이뤄져야 하지만 간단한 설계변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오래된 인허가 물량이 그렇게 쌓일 수 있다. 이러다 분양시장이 좋아지면 일시에 몰려나와 공급충격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 분석 결과였다. 2013년까지의 주택시장은 비관론에 휩싸여 있었고 각 건설업체에서 주택 관련 부서의 축소가 단행되던 시기였다. 그런데도 이전 활황기에 확대됐던 기존 인허가 물량을 털어내지 않고 있었다. 왜일까. 선분양제도하에서 주택 건설업체는 근시안이 된다. 2~3년의 건설기간 이후 입주 시점 주택시장 상황보다는 분양 시점의 열기가 중요하다. 뜨거워진 분양시장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건설사의 대규모 분양이 신경 쓰여 분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물타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아파트 분양시장을 보면 그런 기우가 현실화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2014년 분양 물량은 과거 고성장기의 마지막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2003년의 35만가구에 근접했고 올해는 이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4년 비아파트를 포함한 건축 인허가 실적도 51만가구를 넘어섰다. 주택수요의 기본이 되는 총 가구 수는 상당 기간 증가할 것이지만 연간 증가량은 향후 20년 동안 30만가구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저성장기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신규 주택공급이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국내 주택공급제도는 고성장기에 도입한 선분양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택지는 조성되기도 전에 건설업체에 분양되고 건설업체는 해당 필지가 공식적인 지번을 받기도 전에 인허가를 받고 착공해 아파트를 분양해버리고 피분양자는 분양 받고 몇 년을 기다리면서 해당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가격변동 및 건축과 관련된 리스크를 짊어져야 한다.
정상적이라면 이런 사업 리스크는 당연히 건설업체가 짊어져야 한다. 또 정부가 아닌 민간 건설업체에서 향후 주택시장의 수요가 어떻게 변하고 경쟁적인 공급관계에 있는 타 건설업체의 공급물량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이는 선분양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한 행태이다. 이 선분양제도는 분양가 규제를 비롯해 피분양자의 투기적인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청약제도 및 분배제도 등 누더기가 된 국내 주택공급 관련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선분양제라는 마약을 자율적으로 떨쳐 버리고 후분양제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점진적이지만 정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는 저성장기에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정상적인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체질개선 방안이 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