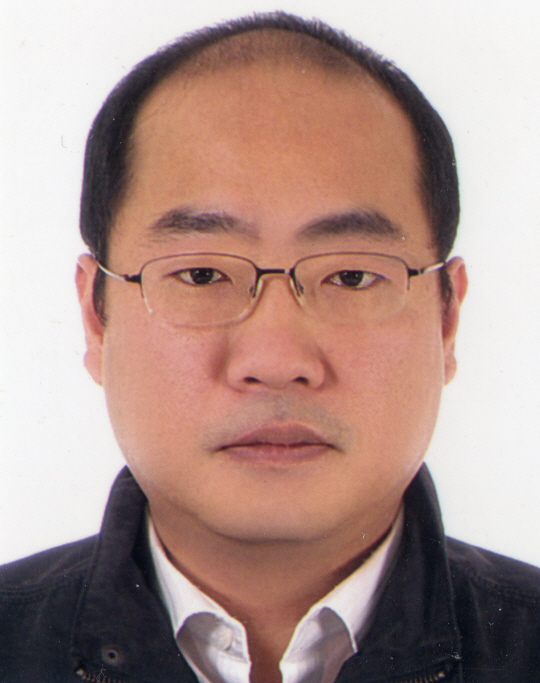1억8,283만명. 지난 10월까지 누적 영화관객이 지난해, 재작년보다 줄었다. 이러면 연간 관객이 2년 연속 역성장할 것이다. 5년 연속 2억명 돌파도 위안이 되지 않는다. 그래 봐야 매출은 1조7,000억원 정도다. 영화관 매출 규모는 집안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해외 온라인 직구, 반려 동물, 수면 시장보다 더 작다. 이렇게 파이는 작은데 역성장이라니, 빨간 불이다.
시장의 주요 주체들은 진즉 그렇게 판단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연초 결산 보고서에서 “극장 시장 포화, 저성장시대로 돌입”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배급사들은 해외 시장 개척이 그 대책이다. 체인영화관들이 지난해 시행한 새로운 요금제는 그 방어일 것이다.
우울한 전망들은 인구 1인당 관람횟수 4.2회에 기반을 둔다. 영진위는 시장조사업체 IHS를 인용하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희망이 사라진다. 총인구는 앞으로 감소하는데 관람횟수마저 이미 다른 나라보다 많으니 시장 성장은 힘들어진다.
잠깐, 오독일 수 있다. 극장관람 경험 층의 연 평균 관람 편수는 9.2편이다(영진위 2017년 조사 참조). 인구수에 대입하면 실제 극장관객은 인구의 46%다. 2억명 돌파 첫해인 2013년은 26%였다. 3년 사이 20%가 증가했다. 그러니 지금은 실제 관객이 증가하는 기간으로 읽을 수 있다.
오해일 수도 있다. 그간 한국영화가 시장을 이끌었다. 그렇다고 한국영화와 한국영화시장이 같은 것은 아니다. 시장 규모와 외국영화 관객 수의 상관관계도 커지고 있다. 빨간 불이 켜진 것은 한국영화 쪽이지 시장 쪽은 아닐 수 있다.
오판일 수도 있다. 지역별 관객점유율 변화는 한국영화에 유리하다. 한국영화가 더 강세인 지방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렇다, 아직 한국영화에는 12개 지역이 남아 있다.
관점 문제다. 성장할 수 없다는 전망이 한국영화를 안전한 상품으로 유도한다. 더 먼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한 방, 그게 안전하다. 이를테면 2013년부터 200만명 이상 관객을 동원한 한국영화가 1편뿐인 장르에 투자하는 게 모험이고 100억대 블록버스터를 잡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 그 결과는? 100개관 이상 개봉한 한국 로맨스가 올해 1편뿐이었다. 글쎄, 외국 로맨스를 보면서 데이트하던 20대들이 가족 관객이 되면 어떻게 될까. 진짜 우울한 전망을 내놓자면 영화를 다시 고민해야 할 때를 한국영화가 자초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