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있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혹자는 매너가 좋은 사람이라 생각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고상함을 잃지 않는 특정 계층의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독일의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작가 아돌프 크니게의 ‘인간 관계에 대하여’를 인용해 품위라는 개념을 이렇게 정의한다. ‘이 법칙들은 단순히 관습적으로 몸에 밴 예의가 아니며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로 자리 잡아야 한다. 계층을 떠나 모든 인간에게는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은 바로 도덕성과 분별력을 통해 우리가 속한 체제를 든든히 유지하는 것이다.’ 즉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타인을 인정하고 배려하며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것이 품위라는 것이다. 책은 차별과 배제, 혐오가 뒤엉킨 ‘무례한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덕목이 바로 품위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무례한 시대’의 단면을 친구와의 대화를 중심으로 보여준다. 사회 기여가 전혀 없는 맥줏집의 매상을 올려주는 것에 대한 고민과 식당에서 대화 없이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가족의 이야기 등 본인이 경험한 일상부터 난민, 젠더, 익명성과 댓글 등 정치·시사 이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가 쏟아진다. 저자의 표현대로 ‘도처에 넘쳐나는 천박함’, ‘역행하는 문명화’의 원인은 각자도생의 사회구조다. ‘나’의 안전을 확보하고 살아남기 위해 ‘타인(혹은 외부인)’을 밀어낸다는 것이다.
책 전반에 소개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무례함에는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특히 경솔한 언행에도 사회적·경제적 성공이 실현되는(책은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현 대통령을 꼽는다) 불합리한 세상에서 ‘품위를 지키며 삶을 꾸려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곱씹어 보게 된다.
개인과 개인을 넘어 국가 간 이기주의와 혐오, 차별이 난무하는 시대, 저자가 ‘품위있는 삶’을 주제로 인간 삶을 고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실 비슷한 문제를 다룬 사회·인문 서적은 차고 넘친다. 이 흔한 주제를 품위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관련 사례와 다양한 문헌을 사유의 재료로 제시했다는 점은 이 책의 미덕이라 할 만하다. 다만 내용 전반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무례한가’라는 사례의 나열이라는 인상이 강해 후반부로 갈수록 버거워진다. 차별과 배제, 혐오의 시대를 살아내는 ‘방법’보다는 ‘그런 시대에 대한 유감’에 방점이 찍힌 점은 아쉽다. 1만 5,000원.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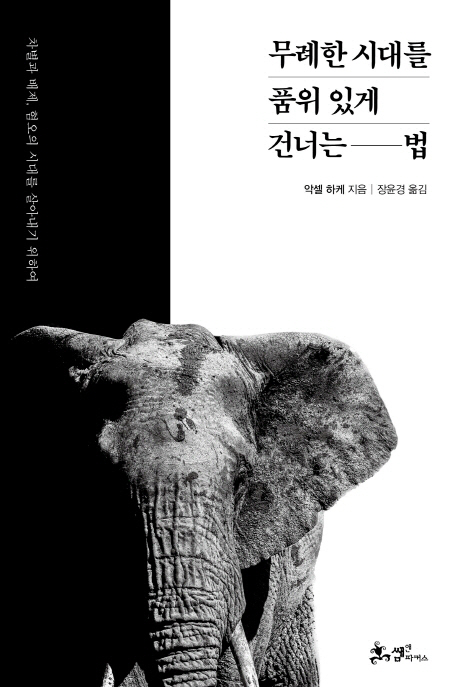

 ssong@sedaily.com
sso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