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턱대고 R&D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자금 투입에 비해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인 국가 R&D 시스템에 대한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R&D 투자 비중은 2위, R&D 투자총액은 4위를 차지하는 등 R&D 투자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속한다.
문제는 R&D에 국가 예산을 투자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내 연간 R&D 투자 대비 특허 건수는 12위, R&D 대비 기술수출총액은 30위, 연구원 1인당 논문 수(SCI 기준) 및 인용도는 33위로 막대한 예산에 비해 손에 쥐는 성과는 초라하다. ‘실험실 기술’이 아닌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상용화는 더 암담하다. 정부 R&D를 통해 획득한 우수 특허 비율은 5.4%로, 민간 R&D(7.9%)보다 떨어진다. 또 대학과 공공연구기관들이 취득한 특허들 중 실제 활용된 특허기술은 34.9%, 기업에 이전돼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된 경우는 14.7%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기술이전 효율성(기술이전수입/연구개발비 지출)은 2017년 기준 1.50%로 미국(4~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계 최대 수준의 막대한 국가 예산을 R&D에 쏟아붓고 있지만 쓸 만한 특허는 부족한 ‘속 빈 강정’ 신세인 것이다.
R&D 투자의 비효율이 심각한 이유는 R&D가 산업현장 등에서 필요한 기술이 아닌 성공률 높은 기술에 치우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연구소 관계자는 “각종 연구소들이 연구용역을 따내려면 과거 연구용역 성공 여부가 중요하다”며 “결국 기술 활용 가능성보다는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과제에 더 힘을 쏟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산업현장에서 원하지 않는 R&D가 양산되다 보니 기업들도 해당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에 잘 나서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산업계와 학계는 지금까지는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이 함께 성과를 공유하는 R&D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김철환 대전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돈 쓰는 연구에서 돈 버는 연구를 통해 연구성과의 시장성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 R&D를 통한 기술개발 내용을 민간이 알 수 있어야 하며, 연구 결과가 시장에 나갈 수 있는 채널의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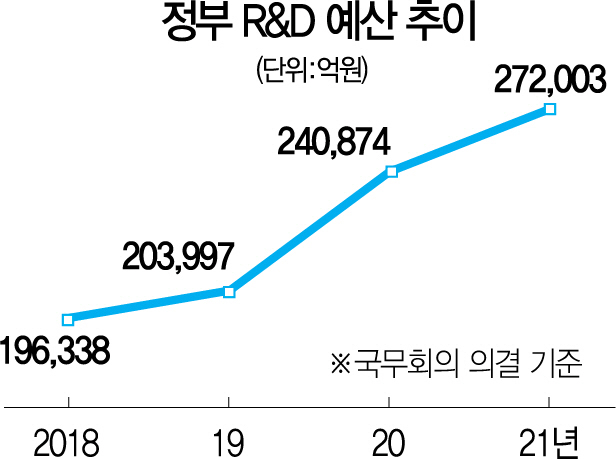
 hit8129@sedaily.com
hit812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