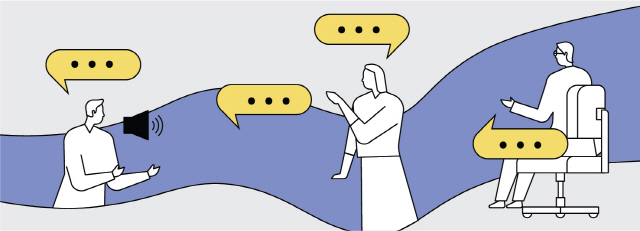흔히 공자와 맹자를 공맹(孔孟)으로 부른다. 이는 맹자가 공자의 유학 사상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두 사람은 사람이 후천적 노력을 통해 도덕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많은 점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말에 대해 상이한 태도를 보였다.
공자는 말이 행동보다는 앞서는 것을 극구 경계했다. 그는 “하는 일에 재빠르지만 말에 조심하라”고 하거나 “말에 더듬거릴 수 있지만 행동에 재빨라야 한다” 또는 “말이 행동보다 지나친 것을 부끄러워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자는 그럴듯하게 꾸며대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가 보기에 좋을지 몰라도 인간다운 맛이 없다고 낮게 평가했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홍보해야 한다. 이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광고 산업의 발달로 이어졌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신제품도 누가 선전하느냐에 따라 소비자의 호응을 받을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공자처럼 말을 유창하게 하기보다 더듬거리는 게 낫다고 한다면 공감을 얻기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공자의 이야기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사람은 말한 대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말할 때 현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상대가 좋아할 말을 쉽게 할 수가 있다. 예컨대 연애할 때 ‘하늘의 별을 따준다’는 이야기와 우는 아이를 달래며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는 약속이 고전적인 사례다. 정치인이 터무니없는 지역 발전을 공약한다거나 듣기는 좋지만 하기는 어려운 다짐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나중에 말한 사람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데 믿는 사람만 약속 실현을 기다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이 때문에 공자는 나중을 고려하지 않고 당장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쉽게 내뱉기보다 나중에 지킬 상황을 생각하며 신중하게 말하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공자보다 100년 뒤에 활약한 맹자는 당시 호변(好辯)으로 이름이 나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 맹자 학단의 안팎에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맹자는 늘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고 공자의 인격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왜 언변이 화려하고 사안마다 논쟁을 벌이는지 이해하지 못 했던 것이다.
그의 제자인 공도자(公都子)가 더 이상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질문했다. “외부 사람들이 하나같이 선생님더러 말이 많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지요.” 주위 사람은 맹자가 호변인 줄 다 알고 있었지만 자신만은 몰랐던 모양이다. 그래서 질문을 받고서 “나더러 어찌 말이 많다고 하는가(여기호변재·予豈好辯哉).”라고 반문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더 이상 자신의 호변을 부인할 수 없었던지 “나는 어찌할 수 없어서 그렇다(여부득이야·予不得已也)”라고 대답했다.
왜 맹자는 부득이할 수밖에 없었을까. 양주가 사회보다 개인의 생명을 앞세우며 군주의 존재를 아랑곳하지 않고 묵적이 나와 남의 가족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자며 어버이의 존재를 존중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두 사람을 구름같이 추종했기 때문이다. 즉 맹자 자신이 나서 양주와 묵적의 위험성을 밝히지 않으면 세상에 도가 상실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호변에 나서게 된 것이다.
현대 경영에서도 스티브 잡스처럼 최고경영자(CEO)가 청바지에 검은 폴라티를 입고 신제품을 발표한다. 이것이 오히려 제품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전의 CEO가 대국민 사과와 같은 일이 아니면 웬만해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과 크게 다르다. 요즘 특히 기업과 고객의 소통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CEO도 부득이하게 호변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정치 지도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치 지도자가 국정 현안마다 말을 하게 되면 진흙탕에 빠지기 쉬우므로 무대 뒤에 남아 있어야 할까. 아니면 브리핑 룸에 주기적으로 나타나 마이크를 잡고 국정 현안에 대한 견해를 솔직하게 밝혀야 할까.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것이 절대적으로 그르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하다. 맹자처럼 부득이하게 호변에 나서지 않으면 의도를 추측하고 미래를 저울질하는 근거 없는 이야기가 줄어들기보다 늘어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