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복 교수의 ‘먼나라 이웃나라’ 시리즈 ‘인도와 인도아대륙 편’(김영사 펴냄)이 나왔다. 이 시리즈는 1987년 ‘네덜란드 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800만부 이상 팔린 스테디셀러다. 이 교수는 이번 편에서 이미 다룬 한·중·일 동아시아를 비롯해 서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에 이어 마지막 퍼즐로 인도아대륙의 역사와 문화를 섭렵한다.
1권에서는 인도와 인도아대륙만의 독특한 세계관과 카스트 제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뒤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갈등 속에서 공존해온 역사를 돌아본다. 인도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잘 갖추고 있는데도 카스트 제도가 뿌리 깊이 남아있다. 저자는 이 같은 모순을 이해하려면 동양과 서양의 이분법적 사고의 틀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이 교수는 인도는 워낙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영향을 주고받은 만큼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문화적 특성으로 꼽는다. 이슬람 무굴 제국을 중국과 더불어 세계 2대 강국으로 만든 것도 포용과 관용의 정신이었다.
2권에서는 평화적인 비폭력 불복종 운동의 마하트마 간디, 적극적인 투쟁방식을 고수한 사회주의자 자와할랄 네루, 파키스탄 건국의 국부로 추앙받는 무함마드 알리 진나 등 인도 독립운동 영웅인 세 지도자를 중심으로 영국에 맞선 독립 투쟁을 살펴본다. 이어 인도·파키스탄·스리랑카·부탄·방글라데시·네팔 등 오늘날 인도아대륙 6개국을 개괄한다.
인도가 지금의 ‘인도’라는 나라 이름을 처음 사용한 것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면서 드넓은 인도아 대륙이 통일되면서부터다. 1947년 영국이 물러나자 인도아대륙은 새로 쪼개진다. 파키스탄은 민족과 언어, 관습이 아니라 역사상 처음으로 이슬람교라는 종교가 건국 이념이 되어 탄생한 나라다. 스리랑카는 원시불교 초기 원형을 그대로 계승한 소승불교의 종주국이다. 이밖에 돈과 삶의 만족이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부탄과 방글라데시, 한번도 식민지가 된 적이 없는 네팔 등을 살펴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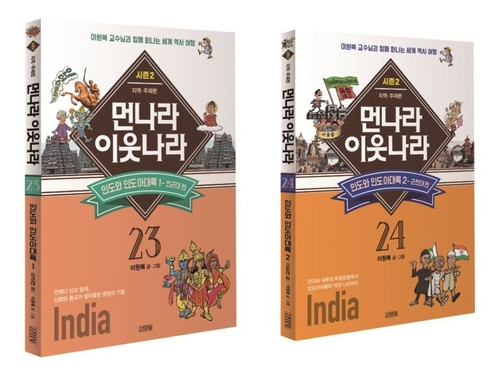
 choihuk@sedaily.com
choihu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