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대의 명실상부한 ‘산업의 쌀’은 반도체다.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신차 출고 지연과 이에 따른 판매 부진의 원인이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난은 반도체의 위상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반도체 생산기지가 몰려 있는 곳은 한국·대만·중국 등 동아시아로, 대만과 한국이 글로벌 프로세서 칩 생산의 83%, 메모리 칩 생산의 70%를 담당한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 정책을 앞세워 급부상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전통적 강자였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신간 '반도체 삼국지'에서 동아시아, 그 중 한중일 반도체 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한다. 그는 책에서 “동아시아가 21세기의 페르시아 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말한다. 반도체 산업이 미국과 중국 간 정치적 긴장감을 높이는 지렛대로 쓰이는 현 상황을 보면 틀리지 않은 비유다. 9월 미국 주도의 ‘칩4’ 첫 예비회의가 열렸고, 미국은 자국 기술을 쓴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본이 2019년 한국에 실시했던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도 반도체가 단순한 산업 제품이 아님을 보여준다. 권 교수는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반도체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며 우리도 차별화된 전략을 준비하려면 특히 일본, 중국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본에서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무너진 교훈을, 중국에게서는 무서운 추격자의 전략을 참고할 수 있다.
책은 우선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왜 빛바랜 과거의 영광만 남은 채 몰락했는지부터 살핀다. 일본에는 엘피다·NEC·도시바·파나소닉·르네사스 등 이름값 높은 반도체 기업들이 즐비했지만 모두 무너졌다. 이들 회사가 부진에 빠진 과정이 상세하게 정리돼 있는데, 저자는 세 가지의 패착을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우선 과도한 기술적 자신감 탓에 세계 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졌다. 시장을 압도하기 위해 과감하게 투자한 혁신 기술이 오히려 수익률의 발목을 잡는 이른바 ‘혁신의 딜레마’도 나타났다. 과도한 정부의 간섭도 문제였다. 1980년대 이후 일본 반도체 산업이 후발주자임에도 급성장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컸지만 간섭이 과해지면서 발목을 잡았다고 책은 지적한다.
중국에 대한 평가는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 요약 가능하다. 2010년대 잇따른 5개년 계획에 따라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했고, 2015년부터는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다. 지역별 반도체생산 클러스터의 급증으로 2020년대 후반이면 제조 규모가 미국, 한국, 대만을 앞지를 것으로 보이며, 팹리스(반도체 설계) 업체도 1990년대 76곳에서 2016년 1400여개로 급증했다. 이를 뒷받침할 재료과학·물리학·화학 등 기초과학 연구에서도 장족의 발전을 이루면서 “부러움과 동시에 두려움으로 다가온다”고 책은 말한다. 하지만 파운드리 업체인 우한훙신(HSMC)의 대규모 투자 사기사건 같은 중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 미국의 극심한 견제 같은 근본적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기술규제는 기술적 상호의존이 복잡하게 얽힌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를 극복한다고 독자적 생태계를 구축하려 한다면 ‘갈라파고스화’를 피하기 쉽지 않다고 저자는 말한다.
자연스럽게 한국의 상황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특히 미중 간 대결구도는 한미동맹의 중요성, 반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는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큰 부담을 안긴다. 저자는 한국이 칩4에 참여해야 할 상황이라면 되레 가장 대체하기 어려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정을 미국에 확보해두고 이를 지렛대로 삼는 등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의 유지가 불가피하며 중장기적으로 중국 내 반도체 산업의 실상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 외에 한국의 시급한 과제로 산학연 클러스터 및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슈퍼 을’ 업체의 양성, 핵심 기술인력과 지식재산(IP)의 보호, 정부 주도의 기초과학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를 강조한다. 2만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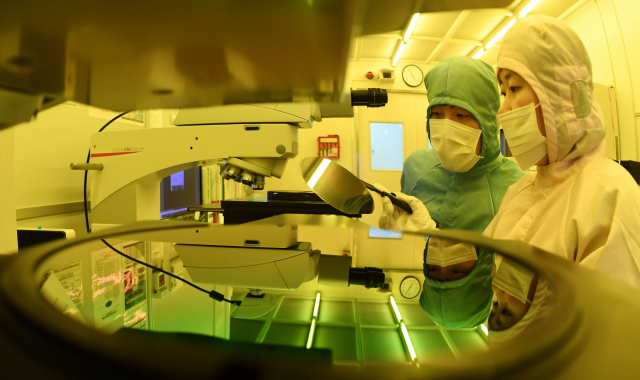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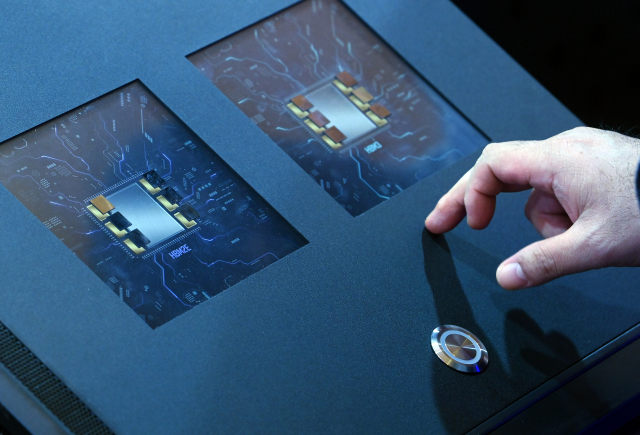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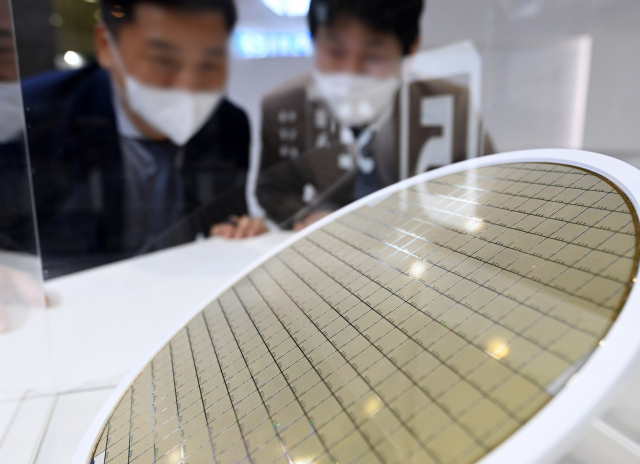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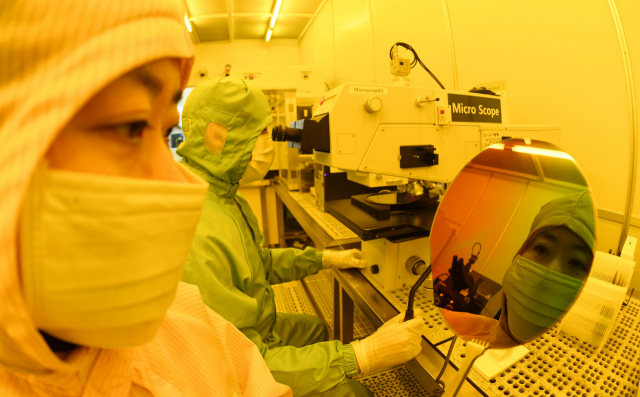
 violator@sedaily.com
violato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