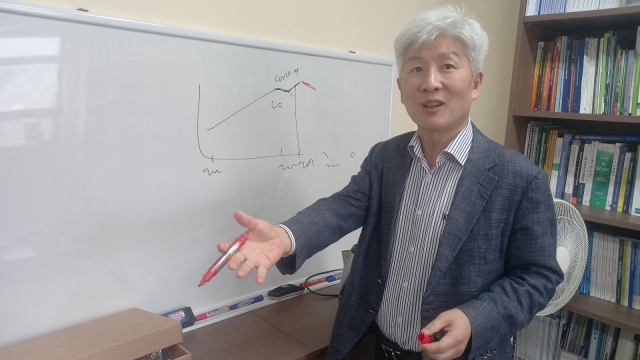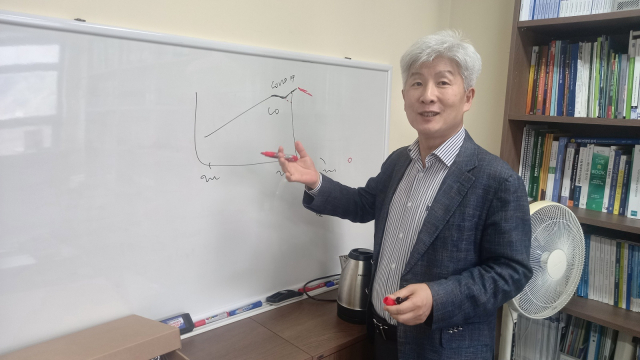“기후변화 하면 쌍둥이처럼 따라다니는 단어가 ‘위기’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바꿔야죠. 우리가 가진 디지털 능력과 녹색 전환 기술을 제대로 결합해 '트윈트랜스포메이션(Twin-Transformation·쌍둥이 전환)'을 이룬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최근 공개한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제3실무그룹(WG) 보고서 주 저자로 참여한 정태용(61)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서울 신촌캠퍼스 연구실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D(디지털)+G(그린)'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비밀 병기'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일본 글로벌환경전략연구소(IGES) 기후변화연구부장, 세계은행(WB) 선임 에너지 이코노미스트, 아시아개발은행(ADB) 주임 기후변화 전문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부소장 등 기후변화 관련 분야에서만 30년 간 활동한 세계적인 전문가다.
그가 볼 때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 수준은 낙제에 가깝다.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지 26년, 파리 협약이 체결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온실가스가 줄어들기는커녕 늘기만 했고 속도도 빨라졌다. 6차 보고서에서도 산업화 시대 대비 지구 온도가 1.5도 올라가는 시간을 직전보다 10년 단축시켰다. 정 교수는 “국제사회가 말만 많았지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의미"라며 “기후변화 대응의 성적표는 ‘D-’”라고 평가했다.
6차 보고서가 ‘온실가스 배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6차 보고서가 중요한 점은 하루 빨리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모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을 담았다는 점"이라며 “우리 세대에서 발생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시급한 일은 지금까지 한번도 내려간 적이 없는 지구 온도를 단 0.01도라도 낮춰 상승세를 꺾는 것이다. 정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다. 민간, 연구소, 국민 등 모두가 나서야 한다. 결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기술, 구체적으로는 ‘디지털’이 그것이다. 인공지능(AI)·챗GPT 같은 기술 혁신은 과거에 상상 만으로 존재했던 것들을 현실화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다르지 않다. 그는 “그동안 녹색 전환에만 포커스를 뒀지만 그것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증명됐다”며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비밀 병기는 디지털과 녹색 전환을 결합하는 ‘트윈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얼마 전부터 기후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인식하게 된 것도 이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를 ‘비용’으로 접근해 왔다. 탄소세를 부과하고 탄소 배출권 제도를 도입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한마디로 생산 비용을 높게 만들어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것이었다. 부담은 온전히 기업과 국민들의 몫이다. 당연히 반가워할 리 없다. 공감은 하지만 직접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다. 정 교수는 “기후변화를 위기로 바라보지 않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자발적인 동참이 이뤄질 수 있다”며 “그 메시지는 우리가 잘하는 것을 잘 이용하면 엄청난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이런 점에서 대단히 유리하다. 유럽은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하고 미국은 기술은 있지만 국토가 너무 넓어 비용 부담이 큰 반면, 우리는 인구가 밀집해 있어 디지털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프라의 효율성도 높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는 반도체, 그린 분야에서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충분히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후변화 대응을 앞으로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나가야 한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 교수는 “창의성을 가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도와주는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며 “이제는 ‘선관후민(先官後民)’의 관행을 ‘선민후관(先民後官)’으로 바꿀 때"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