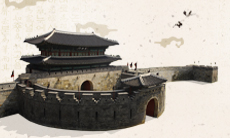미국 뉴욕에서 당뇨병과 비만을 위한 치료제가 가장 처방되는 곳이 비만율이 가장 낮은 부유층이 거주하는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보험분석업체 ‘트릴런트’를 인용해 지난해 뉴욕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 주민 2.3%가 오젬픽이나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 주사제를 처방 받았다고 보도했다.
어퍼 이스트 사이드는 뉴욕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 중 하나로 기대수명이 가장 높고 당뇨나 비만율은 가장 낮다. 그러나 반대로 비만율이 높고 당뇨병이 흔한 이스트 뉴욕의 브루클린의 비만 치료 주사제 처방 비율은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절반 수준인 1.2%다.
뉴욕 전체의 비만율은 25.4%다.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비만율은 9%고 이스트리버 너머에 위치한 사이스이스트 퀸스의 비만율은 43.4%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서 비만 치료제가 가장 많이 처방된 이유는 뭘까? 트릴런트는 이 질문에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답했다.
비만 치료제들은 혈당과 인슐린을 조절하고 식욕을 억제하며 위가 천천히 비워지게 하여 포만감을 증가시킨다. 이는 백인 뉴욕 주민보다 흑인 및 히스패닉계 뉴욕 주민, 아시아계 뉴욕 주민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비만과 당뇨병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
이에 애초 비만치료제가 개발 됐을 때, 인종과 계층간의 건강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됐었다. 그러나 실상은 약에 대한 접근 자체가 불균형하다.
현재 미국에서 비만 치료제는 품귀 현상을 겪을 정도로 인기다. 이에 실제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들은 약을 구할 수 없는 반면 부유층들은 사설 보험을 통해 쉽게 치료제를 구할 수 있다.
미국의 의료보험에 따라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 공적 보험인 ‘메디케이드’의 경우 당뇨병 치료가 아닌 살을 빼기 위해 비만치료제를 사용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반면, 부유층이 가입하는 일반 의료보험은 체중 감량이 목적일 때도 약에 대한 보험금을 보장해 준다.
뉴욕대(NYU) 랭건병원의 내분비과 비만 전문의 프리야 자이싱가니 박사는 "효과가 있는 약이 있어도 접근성이나 이용 가능성 측면에서 장벽에 직면한다. 정말 비만을 치료해야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원활하게 약에 접근하게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