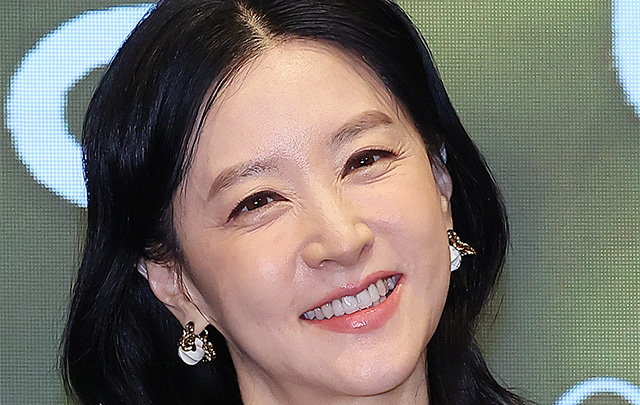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내부통제에 큰 변화가 닥쳐 오고 있다.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에 의하면,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라고 하는 우리로서는 생소할 수밖에 없는 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의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문서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사고 등이 발생했을때 관리자들의 경우 앞으로는 “부하직원의 업무였기 때문에 몰랐다”는 식의 항변은 더는 통할 수 없게 된다.
돌이켜보면 내부통제 제도는 금융위기의 산물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가 금융위기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금융회사의 위험관리기능과 내부통제가 강화돼 왔다.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와 장치를 도입했다. 하지만 신법 시행 이후에도 금융회사 내부의 횡령·배임과 같은 사건 사고나 불완전판매 등 이슈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까지 보였던 것이다.
그렇다보니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높아졌고, 이제는 규범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종전과는 다른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요구받게 된 것이다. 물론 시행 이후의 경과는 지켜보아야겠지만 경영과 내부통제 전반에 걸친 시스템적인 변화 앞에서 이전과 같은 인식과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관련기사
이러한 내부통제 이슈가 비단 금융회사의 것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상장회사를 비롯해 다수의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내부통제를 형식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직 문화로까지 정착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이미 2008년 판결에서 대규모 주식회사가 내부적으로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한 바 있다. 2022년에도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등과 관련해 사외이사에게 감시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기업활동이 고도화되고 전문화될수록 외부적 통제보다는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데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부통제는 본질적으로 위험의 평가로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프로세스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가 멈춰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캐비닛 속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준법통제기준을 흔들어 깨워 째깍거리며 쉼없이 돌아가게 할 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