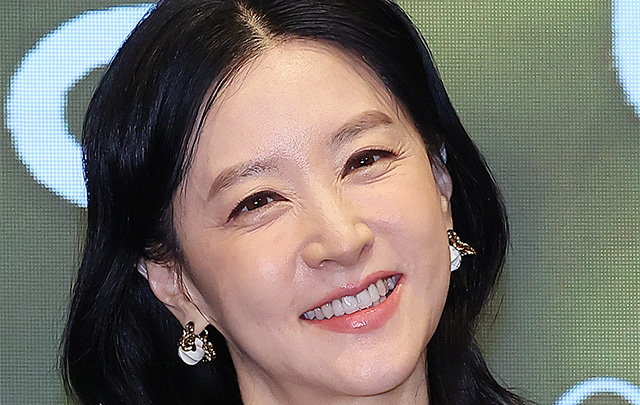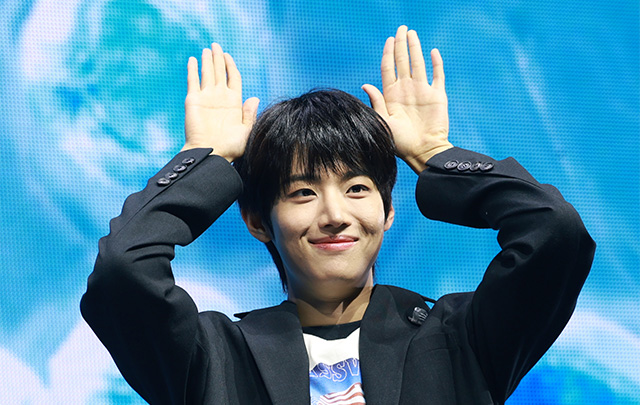“소비자에게 오이가 비싸졌지만, 농민에게는 시세보다 떨어졌어요” (오이 농가 관계자)
대표적인 여름 채소인 오이 값이 최대 만원 대까지 치솟은 가운데,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의 근본적인 취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근 오이값 폭등의 1차 원인은 폭염 탓이지만, 근본적으로 유통구조와 영세화된 농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소매가 기준으로 오이 10개 가격은 지난 5일 1만 6145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13일 기준으로 1만 4433원을 기록했다. 평년 1만 1862원에서 오르내리던 것과 비교하면 17% 가까이 오른 가격이다.
한국물가정보는 올해 오이값 폭등의 원인으로 폭염을 꼽았다. 폭염으로 인해 오이가 무르면서 상품으로 나올 수 있는 오이 숫자 자체가 줄었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오이 농가에서는 폭염이 도매값 폭락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경남 지방의 한 오이 농가 관계자는 “명절을 앞둔 대목이라 시세가 좋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시세보다 1만원 이상 떨어지면서 경매가 취소되는 ‘불락’을 몇 번이나 당하고 있다”면서 “경매사들에 따르면 폭염 때문에 사러 오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경매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고 전했다. 오이농가들에 따르면 올해 예상한 시세는 다다기 오이 한 박스(5kg) 기준으로 2만원 중반이지만, 실제 경매가는 1만원 초중반에 이뤄지고 있다. 폭염으로 도매시장에서는 오이를 사려는 손길이 줄었고, 그 만큼 소매상에 전해지지 않으면서 소비자가 살 오이가 줄어드니 소매가가 오르는 상황인 셈이다.
근본적으로는 중간유통단계를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농수산물 유통은 크게 생산자-산지유통-도매유통-소매유통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그러나 산지유통 과정 안에는 생산자에서 경매장까지 운송하는 도매업자,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 다시 도매상에 전달하는 도매업자 등 세부 단계가 늘어난다.
그 결과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생산자는 전체 판매가의 44%만 취하고 나머지 56%는 유통 비용으로 쓰이며, 생산자의 몫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정부는 온라인도소매, 지역도매 등 중간단계를 줄이고 대형화하는 대책을 수 년째 내놓고 있지만, 농수산물 유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공영도매시장의 변화 없이는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32개소에서 운영 중인 공영도매시장은 과거 도매상의 폐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려는 명목으로 개설됐다. 그러나 현재 공영도매시장 내 일부 도매법인은 지정제도 아래 놓여있어 경쟁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형마트가 공영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내놓는 일부 농수산물의 경우는 생산자로부터 대량구매 후 보존을 통해 적기에 싼값으로 내놓기도 한다. 롯데마트의 경우 시세가 저렴할 때 사과와 수박, 양파와 감사 등 10여개 품목을 산지에서 대량으로 구매한 뒤 신선품질혁신센터에서 약 1000톤까지 저장한다. 롯데를 비롯한 대형유통사는 CA(Controlled Atmosphere)저장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온도, 습도, 공기 중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 등을 조절해 농산물의 노화를 억제, 수확했을 때의 맛과 신선도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롯데마트가 이번 추석 시세보다 40% 싼 시금치를 내놓을 수 있는 이유도 경기도 포천 산지에서 대량 매수해 저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각 농장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몰을 통해 농장과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아 거품이 적고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지만 가격은 기대만큼 낮지는 않다는 평가도 많다. 한 소비자는 “신선하고 다양한 품종을 그 때 그 때 살 수 있어서 좋지만 가격은 택배비를 포함해 대형마트의 세일 가격 수준”이라고 말했다. 판매 농가 입장에서는 신선식품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비자의 불만을 일일이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미국의 ‘선키스트’,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 농가가 모여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성장한 해외의 농가들에 비해 우리 농가는 영세화 노령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셈이다.
온라인 농수산물 거래 플랫포인 오아시스의 관계자는 “e-커머스에서 가장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농수산물 등 신선식품”이라면서 “산지에서 최상품으로 생산을 해도 배송 과정에서 맛과 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산품이나 가공식품 보다 훨씬 까다롭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why@sedaily.com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