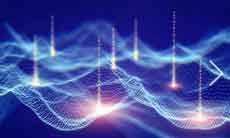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건설근로자 10명 중 8명이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0일 내놓은 '건설현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건설업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22만5000여명으로, 전체 건설근로자의 14.7%를 차지했다. 체류자격과 국적이 확인된 근로자 중에서는 조선족이 8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선족을 제외한 중국인(5.9%), 베트남인(2.2%), 한국계 러시아인(고려인·1.7%)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보면 재외동포비자(F-4)가 50.4%로 전체의 절반이었다.
이 비자는 한때 대한민국 국적이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외국 국적 동포에게 부여된다. 해당 비자로는 단순노무 취업이 제한되지만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이 비자를 가진 근로자들이 다수 일하고 있어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입직 연령은 42.5세, 현재 평균 연령은 47.4세로, 내국인보다 각각 3.2세, 4.4세 더 젊었다. 특히 캄보디아(29.2세), 미얀마(30.7세), 베트남(32세) 등 동남아 출신 근로자일수록 입직 연령이 낮은 특징을 보였다.
이들의 근무지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38.3%로 가장 많았고 서울(18.5%), 인천(9.6%) 등까지 포함하면 66.4%가 수도권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거주지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81%에 달했다. 일자리가 몰려 있는 대형 건설현장이 수도권에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근속기간은 평균 5년3개월로, 내국인 평균(7년2개월)보다 약 2년 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건설근로자 대부분이 비자 기간에 제한이 있어 장기 근속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비전문인력을 위한 비자인 E-9의 경우 통상 3년의 체류가 가능하다.
아울러 이들이 퇴직 후 수령한 평균 퇴직공제금은 약 401만원으로 집계됐는데, 내국인의 평균 수령액인 346만원보다 60만원 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들은 비자 만료나 출국 등으로 퇴직공제금을 수령해야 하는 시점이 명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내국인 근로자는 일용직에서 사용직으로 전환, 타업종 이직, 부상 등 다양한 사유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