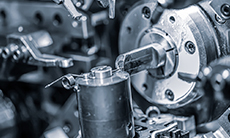요즘 실리콘밸리 최대 화두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손수 작성했다는 ‘더 리스트’다. 저커버그가 초지능(ASI) 구현을 위해 메타에 영입하고자 하는 최고급 인재 목록이다. 구체적인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목록에 오른 인물 대부분이 회사와 학회, 개별 모임을 통해 친분을 쌓은 실리콘밸리 ‘인사이더’라고 한다.
‘더 리스트’는 h인덱스(연구자의 연구 생산성과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처럼 학계에 끼치는 영향력을 정량화하지는 않았다. 노벨상이나 필즈상·튜링상 같은 역사와 권위도 없다. 수치와 수상 경력이 무슨 소용일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신화를 쓴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고르고 고른 인재 목록이다. 성공한 창업가를 존중하다 못해 숭배하는 실리콘밸리에서 ‘더 리스트’가 지닌 권위는 그 어떤 지표나 상훈보다도 높다. “더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면 일류 인공지능(AI) 연구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저커버그는 ‘더 리스트’ 속 인재 영입을 위해 직접 e메일 및 왓츠앱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돌리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사생이나 고졸 창업가에게 카카오톡으로 채용 제안을 보내는 격이다. 한국에서는 상상조차 힘들다. 미국에서도 흔한 일은 아닌 듯하다. 영입 제안을 받은 이들 중 일부는 “내가 저커버그”라는 말에 스팸이라 여기고 차단해버렸다는 농담 같은 얘기도 들려온다.
저커버그가 인재 영입에 투입하는 금액은 더 농담 같다. 메타초지능연구소(MSL)를 이끌 인물로 낙점된 알렉산더 왕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왕이 설립한 스케일AI의 지분 49%를 149억 달러(약 20조 원)에 매입했다. 스케일AI가 AI 연구에 필수적인 데이터라벨링에 뛰어난 회사라는 점을 감안했겠으나 1년 전 138억 달러(약 18조 8500억 원)였던 기업가치를 2배 이상으로 쳐줬다.
왕과 조직을 이끌 냇 프리드먼 전 깃허브 CEO, 다니엘 그로스 전 SSI CEO 영입을 위해서는 두 인물이 설립한 펀드 지분을 매입했다. 오픈AI와 구글 딥마인드, 앤스로픽 소속 연구원을 빼내려 제안했다는 ‘최대 1억 달러(약 1380억 원) 보상’이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다. 세상을 바꿀 최고의 인재에게는 말 그대로 돈이 아깝지 않다는 신호다.
인재 쟁탈전의 이면에선 싸늘한 대량 해고의 공포가 흐른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1년 새 1만 8000명을 내보냈다. 초반에는 저성과자, 무능한 관리직을 향하던 칼바람이 이제 영업맨과 AI 개발자에게 미친다. 수천 명을 잘라 한 명의 천재에게 인건비를 몰아주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평범한 인간보다 엔비디아 AI 가속기 하나의 가치가 높다는 계산이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
실리콘밸리 최상위 그룹은 본래 명문대 학력과 화려한 창업 경력 없이 들어갈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였다. 이제는 학력조차 무의미한 듯하다. MSL에 합류한 그로스는 대학에 입학조차 하지 않은 채 19세에 창업 전선에 뛰어든 인물이다. ‘더 리스트’에 오른 천재들 사이에서 평범한 아이비리그·스탠퍼드 졸업자는 매년 수만 명씩 양산되는 일반인일 뿐이다.
한국의 SKY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시대에 대학 서열과 문·이과, 각 학과의 ‘입결 성적’으로 다투는 게 농담 같이 들린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몰리던 컴퓨터공학과는 취업난을 걱정한다. 유행처럼 번졌던 ‘코딩 부트캠프’ 출신 저경력 개발자들은 구조조정 우선순위다. 과거 판교에서 회자되던 “결론은 모두 치킨집 창업”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다시금 떠오른다.
모두가 천재일 수는 없다. AI에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 되자는 말도 막연한 구호일 뿐이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대세와 유행을 좇는 안일함, 도식과 전례를 찾는 나태함으로는 미래를 논하기는 커녕 생존을 걱정해야 할 때가 멀지 않았다. 생각보다 빠를 것이다.
“5년 안에 세상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사람들도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처럼 삶과 직업을 계획한다. 인간은 불확실성을 낮추고자 하는 잠재의식에 변화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의도적인 과도한 변화로 ‘수정’을 시도한다. 그럼에도 종종 변화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오픈AI 정형원 박사의 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eherenow@sedaily.com
behereno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