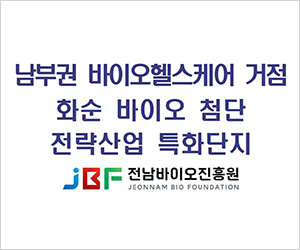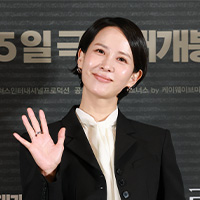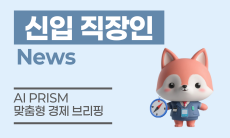정부가 무리하게 확대해온 전세금 반환보증제도가 오히려 사기를 확산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를 임대인에게 전환하고 담보한도를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전세사기의 뿌리는 정부가 보증금 전액을 책임지는 담보인정비율 100% 정책’이라면서다.
임차인 보호 장치로 설계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가 오히려 전세사기를 조장했다는 비판이다. 핵심은 2017년 2월부터 전 주택유형에 담보인정비율 100%를 일괄 적용한 조치다. 집값이 1억 원인 주택에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설정하더라도 전액을 HUG가 보증해주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다. 전세사기꾼들이 그 틈을 파고들어 감정평가서를 조작해 시세를 부풀렸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실제 경실련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반환보증 가입 실적은 2013년 765억 원에서 2023년 71.3조 원으로 11년 만에 약 1000배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HUG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9.8조 원에 달했다. 이 중 74%인 7.2조 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대위변제의 상당수는 수도권과 다세대주택에 집중됐다. 전체 대위변제의 89%가 서울·경기·인천에서 발생했고, 유형별로는 전체 보증가입의 14%에 불과한 다세대주택이 대위변제액의 48%를 차지했다. 다세대의 대위변제 발생률은 10%로 아파트(1%)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임대인 책임이 빠진 보증 구조도 문제로 지목됐다. 반환보증 상품은 현재 사실상 임차인 가입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임대인·임차인용으로 나뉘어 있었다. 실제 2013년 614억 원 수준이던 임대인용 가입액은 2024년 3억 원으로 99.5%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임차인용은 150억 원에서 67조 원으로 4484배 급증했다. 경실련은 “임대인은 보증료 부담 없이 수익을 얻고, 임차인은 보증금과 보증료까지 부담하는 이중고를 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반환보증 개편과 함께 △전월세신고제 전면 시행 △전세대출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임대사업자 혜택 전면 재검토 △장기공공주택 대규모 공급 및 보증금 미반환 주택의 공공매입 등 포괄적인 전세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경실련 측은 “새 정부가 더 이상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개발정책에 힘을 쏟지 말고 관리 가능한 전세제도를 만드는데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rassgun@sedaily.com
brassg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