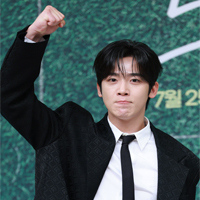한국 제조업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과거의 도전은 후발국에서 왔지만 그때는 더 빨리 뛰면 해결됐다. 그러나 지금은 선진국에서도 함께 온다. 혁신이 해법이라고들 말하지만 혁신할 준비가 돼 있나.
혁신은 절박함에서 나오고 절박함은 공포나 욕망에서 나온다. 전쟁은 원초적 공포가 본능을 지배하는 사건이다. 비정하지만 전쟁은 기술과 생산 방식의 혁신을 낳고 난공불락 같은 사회 관습에도 변화를 준다. 평화가 돌아오면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 변화에 적응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갈라진다. 75년 전 미국 조선업 혁신이 좋은 사례다.
2차 대전 중 독일은 U보트로 연합국 군함과 상선을 공격해 많은 전과를 올렸다.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계기로 참전한 미국은 “적들이 격침한 선박보다 더 많은 선박을 생산한다”는 모토로 ‘리버티십’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리버티는 저렴하고 빠른 제작이 가능한, 대량생산에 적합한 건화물선으로 개발됐다. 이때 채택된 표준 공법이 용접과 블록 제작이다.
20세기 초 현대적 용접 기술이 개발돼 각국의 조선소가 부분적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조선소의 주류 기술은 여전히 검증된 리벳 공법이었다. 리벳은 철판에 구멍을 뚫고 삽입해 물리적으로 결합시키는 부품이다. 리벳 공법은 철판 이음매 사이로 물이 새기 쉽고, 재료를 겹쳐서 자원이 낭비되고, 무엇보다 많은 시간과 작업자가 필요했다.
미국 정부는 리스크를 무릅쓰고 용접 기술을 전면 채택했다. 또 건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육상 부지에서 미리 선박 모듈을 제작해뒀다가 조선소 야드로 옮겨 조립하는 블록 건조 공법도 도입했다. 리버티는 연합국에 전시 물자를 안정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승전에 큰 기여를 했다. 1941~1945년 사이 리버티가 총 2710척이 제작됐는데 1호선 제작에 244일이 걸렸지만 후반에는 평균 42일로 단축됐다. 같은 기간 미국은 리버티를 포함해 6000여 척의 선박을 생산했는데 오늘날은 클락슨 통계 기준으로 연간 30척을 제작한다.
수백만 미국 여성들도 전쟁에 참여했다. ‘리벳공 로지(Rosie the Riveter)’로 불린 이들 여성은 용접봉 또는 리벳건을 들고 조선소나 군수 공장에서 일했다. 여성들이 직업 전선에 뛰어드는 것에 부정적이던 전통적 사고에도 일대 전환이 생겨 전후 여성의 사회 참여와 인권 신장의 원동력이 됐다.
슈퍼 탱커의 아버지로 불리는 미국인 대니얼 루드비그는 1951년 일본 정부로부터 히로시마 구레조선소를 10년간 임차했다. 미국에 초대형 유조선을 건조할 만한 조선소가 없기도 했지만 미 정부가 조선업에 흥미를 잃었기 때문이다. 구레조선소는 태평양전쟁 때 세계 최대 전함 ‘야마토’를 건조한 이력이 있다. 지금은 이마바리조선이 6월 말 인수를 발표한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 소유다.
루드비그는 리버티 프로그램을 통해 획득한 첨단 용접 기술과 블록 제조 공법을 구레조선소에 적용했다. 그 결과 당대 최대의 유조선들을 저비용으로 진수하면서 일본 조선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미국의 앞선 제작 기술과 일본식 관리 기술을 성공적으로 결합해 일본은 1956년 영국을 따라잡고 이후 수십 년간 세계 조선업을 호령했다. 반면 산업혁명의 발상지였지만 조선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영국은 세계 무대에서 사라졌다. 1892년 영국 조선업 점유율은 80%를 넘었다.
바야흐로 경제 전쟁의 시대다. 총칼 대신 상품·자본·기술로 싸우는 전쟁이다. 개도국의 전유물이던 제조업 정책을 선진국이 앞장서 한다. 소중한 주력 산업을 지키면서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만드는 것이 지상 과제다. 비상한 각오와 혁신이 필요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