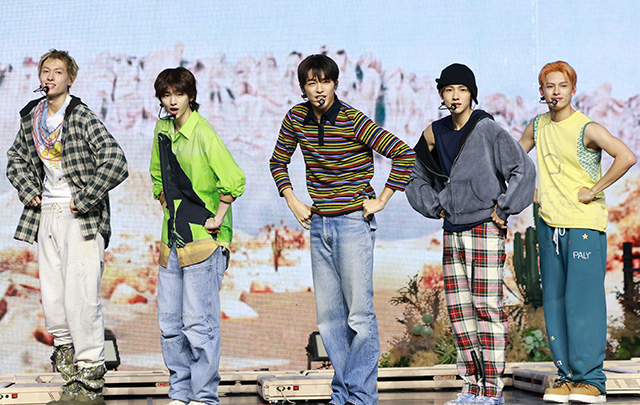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기업과 공공, 국민 일상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비전이 제시됐다.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는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망라한 패키지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당정협의가 끝난 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은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하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이 ‘기술 선도 성장’을 앞세우며 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다짐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대상 범위를 넓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당정의 방침은 우려된다. 지속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확대라지만 자칫 국민연금을 지렛대로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나랏돈 씀씀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이미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된 상황에서 당정 일각에서는 3차 추경 가능성이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30조 원가량이 소요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대거 확대하려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돈 풀기’ 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금 살포성 기본소득은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글로벌 경제학계의 통찰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에서 패트릭 크라우스 오픈리서치 연구원은 미국 실험 결과를 발표하며 “현금 지원은 노동 공급을 줄였지만 생산적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기본소득의 한계를 지적했다. 더구나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은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암울하다.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란다면 경제정책 방향을 ‘재정 주도’가 아닌 ‘기업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가 과감한 규제 혁파에 나서야 기업들이 투자를 대폭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 의욕을 가질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