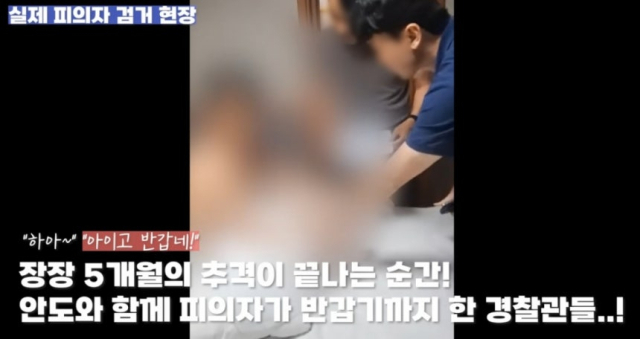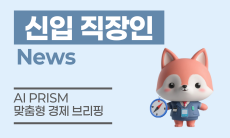“밤마다 침수된 앞집 이웃이 떠올라요. 도통 잠을 못 자겠어요.”
폭우가 쏟아진 7월 말 경기 가평 주민센터 한편에 간이 부스가 마련됐다. 2평 남짓한 이 공간에는 ‘행정안전부 재난피해 무료 심리상담’이라고 적힌 A4 용지가 엉성하게 붙어 있었다. 상담을 찾은 한 수해 피해자는 5분 정도 속마음을 털어놓다 주위를 의식한 듯 이내 자리를 떴다. 상담사는 “최소한 밀폐된 공간이라도 제공해줘야 하지 않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날 한산한 부스와 달리 피해 지원금을 받으려는 줄은 길게 이어졌다.
사회·자연 재난이 잇따르면서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원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크다. 행안부가 운영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는 센터당 담당자가 사실상 1명뿐이다.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담 인력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경기 남부와 달리 북부 지역은 상담사가 턱없이 적어 호우 피해 당시 강원 철원 거주자가 가평으로 파견돼야 했다.
대표적인 인재로 꼽히는 산업재해도 다르지 않다.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고를 경험한 동료와 유가족의 트라우마 상담 수요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근로자건강센터의 인력은 4년째 제자리걸음이다. 한 산재 유가족은 “정부의 상담 지원 제도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개인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책임자 처벌 못지않게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일도 중요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작 뒷전이다.
한 전문가는 트라우마를 ‘미세먼지’에 비유했다. 건강을 위협하지만 존재를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의미다. 실제 가평에서 상담 부스를 지나친 대부분은 ‘이 정도는 다들 힘들지’라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이었다. 전문가는 “잠재된 트라우마는 몇 년 뒤에도 언제든 자신을 갉아먹을 수 있다”며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만 대책을 마련하는 분위기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이 우울증을 앓다 숨지면서 부실한 트라우마 관리 실태가 또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 많은 이들이 일상과 일터로 돌아오기 위해 한순간의 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e@sedaily.com
m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