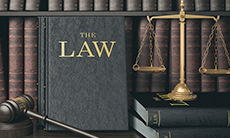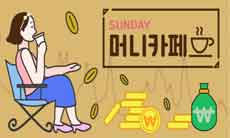우리는 자본과 노동 중심의 산업화 경제를 지나 지식·정보가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이자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지식 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 지식 경제로의 전환 속에서 저작권 산업은 단순히 영화·음악·도서 등 저작물의 소비를 넘어 전 세계에 K문화를 알리고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8월에 발매한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의 앨범 ‘카르마’가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7년 연속으로 앨범이 차트 정상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드라마에서는 조선시대 배경의 ‘폭군의 셰프’가 넷플릭스 비영어 TV쇼 부문 1위에 오르며 전 세계 음식을 우리 문화와 정서에 담아낸 이야기가 세계인의 공감을 얻고 있다. K콘텐츠를 앞세운 저작권 산업의 성장은 우리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한편 경제적인 성과로도 나타나고 있다.
올 3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저작권 무역수지 잠정치는 약 33억 6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흑자이자 11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저작권 무역수지의 호조로 산업재산권 분야의 적자를 만회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적자에서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문화 예술 저작권 부문에서 5억 2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 K팝·드라마·게임 등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작권 산업의 성장은 관광·미용·가공식품 등 연관 산업으로 확장되면서 경제 전반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K콘텐츠 스타들을 만나기 위해, 드라마 촬영지를 직접 보기 위해 한국을 찾는 관광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4년 K뷰티 수출은 102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주요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했고 한국산 냉동 김밥과 떡볶이 등 가공식품의 수출도 전년 대비 39.3% 성장했다.
저작권 산업과 연관 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을 연계한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저작권 산업은 한 나라의 문화를 상품화하는 것으로 다른 산업처럼 기술과 자본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문화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동하는 것이 바로 저작권이다. 기술 연구개발(R&D) 성과를 특허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 육성 정책들과 연계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산업재산권 분야와는 정책적으로 차이가 있다. 최근 지식재산이라는 공통점에 주목해 두 영역의 정책 부서를 통합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단순히 개념적 유사성에 주목하기보다는 정책적 지원의 효율성과 경제적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산업은 문화 예술 창작 생태계가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등 관련 산업 활성화 정책과 이어질 때 연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문화 예술 및 콘텐츠 창작 생태계 전반을 뒷받침하는 정책과 제도적 장치가 종합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예술 교육을 강화해 차세대 문화 예술 인력을 육성하고 기초 예술 지원을 확대해 창작의 토양을 넓혀야 한다. 또 음악·게임·방송·웹툰 등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작 인프라 제공을 통해 K콘텐츠의 세계 시장 진입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 산업은 문화와 경제를 동시에 성장시키는 전략자산이다. 저작권과 문화예술 진흥 정책, 콘텐츠 지원 정책의 결합과 조화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여는 저작권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열쇠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