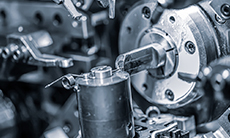서울 집값이 ‘불장’ 조짐을 보이는데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정부는 해묵은 재탕·삼탕 규제 카드나 만지작거리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7% 올랐다. 9월 첫 주 0.08%였던 상승 폭이 매주 커지는 추세다. 광진구 아파트 가격은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 외곽 지역까지 초강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6·27 대출 규제로 ‘반짝’ 안정세를 보이다 9·7 공급 대책 발표 이후 되레 오름세가 확산됐다. 2030년까지 매년 27만 가구씩 착공한다지만 임대·공공주택 위주라 민간주택의 공급 절벽 우려만 키웠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넉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이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을 확대해 대출을 죄는 방안이 유력하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더 줄이거나 전세·정책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보유세를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수십 차례의 대책이 외려 집값 폭등을 불러왔던 ‘문재인 정부 시즌2’ 우려가 크다. 당시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은 전월세 가격 급등과 ‘똘똘한 한 채’ 쏠림을 부추겼고 서울 집값 폭등과 지방 미분양 사태라는 최악의 주택 양극화를 초래했다.
집값 안정의 근본 해법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은 턱없이 부족한 2만 가구에 그칠 듯하다. 서울은 신규 택지가 거의 없는 데다 공급 물량의 88%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공사비 갈등이나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수요 분산을 위해 조성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도 절반가량은 인허가만 받고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금은 단기적 수요 억제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 공급 대책 제시가 더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정비 사업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완화, 용적률 상향 조정,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과감한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행정 주체 간의 정교한 정책 조합도 병행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임대 등 서민 주거 불안 해소에 주력하고 서울시가 정부의 협조 아래 도심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