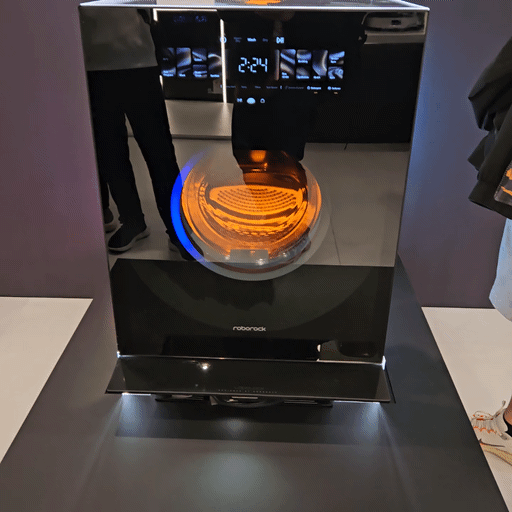|
요즘 정보통신부 주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인물은 오는 4월11일 퇴임하는 황중연(53ㆍ사진) 우정사업본부장이다. 갑론을박의 원인은 그가 최고 경영실적을 내고도 떠나야 한다는 사실. 황 본부장이 총 4만2,000여명의 대조직 수장으로 취임한 것은 지난 2005년 4월12일이었다. 그 뒤 2년. 우편과 금융 부문이 양대 핵심 사업인 우정본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매출액 4조1,358억원에 순이익 1,952억원을 올리는 조직으로 탈바꿈했다. 매출액과 순이익 모두 99년 이래 사상 최대치다. 더 고무적인 일은 2003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우편사업 분야가 4년 만에 첫 흑자로 돌아선 점. 우편사업 부문은 인터넷 대중화와 e메일 급증이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2003년 461억원, 2004년 622억원의 적자를 내는 골칫덩어리였다. 황 본부장은 취임 첫해 우편사업 부문의 적자폭을 65억원대로 줄여놓은 뒤 지난해 906억원의 흑자를 내는 알짜사업으로 바꿔놓았다. 게다가 그는 특유의 카리스마로 폭과 깊이 면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체질을 전반적으로 한 단계 올려놓았다는 게 중평이다. “떠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나”며 손사래를 치는 그를 서울 광화문 정통부 청사 복도에서 근황부터 물어보며 ‘복도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직원들에게 고맙고 미안할 뿐”이라고 했다. “드라이브를 거는 업무 스타일을 따라오는 과정에서 상처 입은 직원들이 혹 있을까 걱정이 많았다”고도 했다. 일기예보에 민감한 남자로 변했다는 말로 지난 2년을 압축하기도 했다. “아침 TV로 기상 체크를 하는 게 하루의 첫 일과가 됐다”고 말했다. 기상이 최악일 경우 1만7,000여 집배원들의 동선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주는 게 황 본부장의 몫이다. 그는 공기업 흑자론에 대해 “공기업 적자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워지게 돼 있다”며 “수익구조가 건실해야 국민 부담이 줄고 직원 복지후생을 챙길 힘이 생기며, 이는 곧 대국민 서비스 개선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나타난다”는 지론을 밝혔다. 황 본부장은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독립시키는 작업을 완결하지 못한 것을 아쉬운 미완의 사업으로 꼽았다. 내부적으로는 외근직원이 많은 조직 특성상 사고가 많은 근무환경을 완벽하게 개선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지난해 천안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 집배원추모공원을 조성해 순직비를 세운 뒤 정식으로 제(祭)까지 지낸 것도 다 이런 연유에서였으리라. 그는 지난해 교수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연구조직인 ‘우정 포럼’에 기대를 거는 듯했다. “그간 연구해온 개선방안이 후임자의 경영에 반영되지 않겠냐”는 것. 그는 “취임 초에 했던 약속을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조용히 떠날 것”이라면서 총총히 발을 옮겼다. 정통부의 한 간부는 “우정사업본부의 보고서가 최근 꽉 차 있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방향을 제대로 잡아 일해왔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고 생각한다“고 촌평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