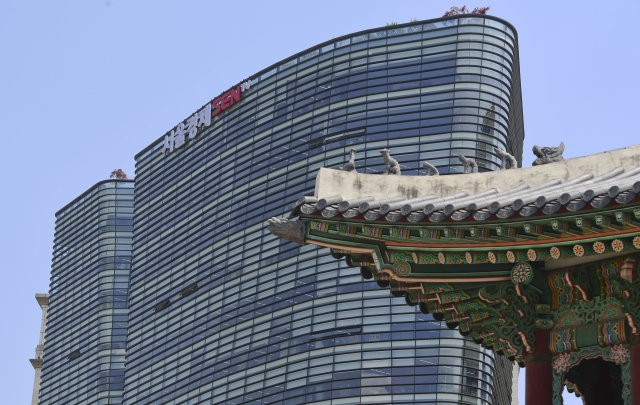|
지난 3월 한국은행이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를 1%대인 1.75%로 낮췄다. 3개월 후 한은은 금리를 추가로 내려 기준금리는 현재 1.50%다. 2·4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3%를 기록하며 7분기 연속 1% 미만에 머물렀다. 저성장에 초저금리까지 경제환경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뉴노멀' 상황을 우리보다 먼저 경험했다. 저성장과 저금리를 넘어 국부(國富)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해법을 찾기 위해 서울경제신문 기자들은 6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본 도쿄, 싱가포르와 홍콩을 누볐다. 그 결과물이 최근 3주간 연재된 글로벌 자본 전쟁에서 한국의 길을 찾는 기획 시리즈였다.
미국은 7년 동안 사실상 0%대 금리에 머물렀고 일본의 제로 금리는 20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산업혁명의 고향인 영국은 제조업 강국의 지위를 내려놓은 지 수십 년이 됐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 앞서 축적한 자본을 성장하는 해외 신흥국에 수출해 국부를 늘리고 국민은 풍요를 유지했다. 단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두 배 정도인 영국의 해외투자 규모는 우리의 16배에 이른다. 16조달러를 해외에서 굴리고 있는데 한 해 수익률이 3%만 돼도 5,000억달러에 달해 한국 GDP의 40%에 육박한다. '돈이 일하는(money works)' 틀을 갖춘 영국의 자본은 지금도 해가 지지 않는다.
반세기 수출 한국을 기치로 정부와 기업·가계는 어느 정도 자본을 쌓았다. 외환보유액은 3,700억달러를 넘어섰고 국민연금은 50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1997년 말 외환위기의 아픔을 딛고 해외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선 지 10년가량이 지났다. 경제의 새 패러다임으로 자리한 저성장과 저금리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투자의 당위성은 '바이블'이 되고 있다.
마침 자산운용(Wealth Management)을 필두로 한 금융업은 '사람이 곧 경쟁력'이어서 한국의 미래는 어둡지 않다. 10년 동안 적잖은 실패로 눈물도 삼켰지만 값진 경험과 교훈 속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전문 인력도 늘어가고 있다. 최근 2~3년 한국투자공사(KIC)나 국민연금은 선진국의 국부 펀드나 연기금 못지않은 수익률로 이를 증명하고 있다. 다만 과거 수출 역군의 기를 북돋웠던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자본 수출의 첨병인 운용역들의 높은 임금이 종종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걸핏하면 국민연금과 KIC 등이 정치 바람에 휩쓸리는 구조도 아쉽다.
세계 최고의 국부 펀드로 꼽히는 싱가포르 테마섹의 운용역들은 65세까지 철밥통의 고액 연봉으로 유명하다. 싱가포르 국민은 이를 비난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기며 테마섹의 행보를 존중하고 있다. 변화무쌍한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노후의 안락한 삶을 보장하며 국가의 부를 키우는 길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손철 증권부 차장 runiro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