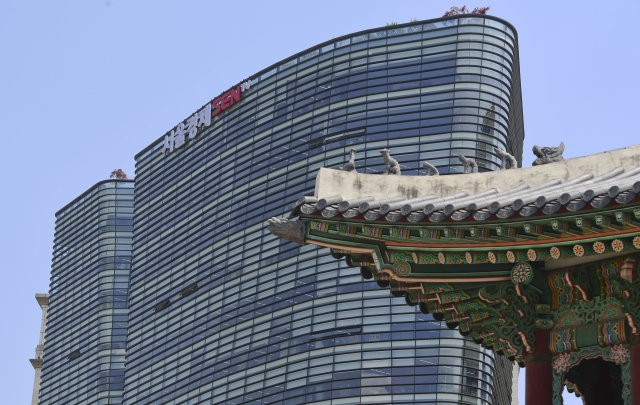|
이웃 한구스탄공화국의 정치상황은 대한민국과 여러모로 닮은꼴이다. 요즘 그쪽 의회 돌아가는 모습이 꽤 흥미롭다. 잠시 들여다보기로 하자.
지난해 집권 여당인 새머리당 대표로 취임한 키모센코는 하루하루가 즐겁다. 여론조사 때마다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율에서 야당인 피라냐당의 모제인 대표를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키모센코의 속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 그로서는 정작 대선에 뛰어들 생각이 없다는 것을 말이다.
"나는 아직 스스로 대권주자 자격이 없고 나한테 그런 기회가 오겠냐는 생각을 한다"는 평소 발언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그런데도 주변에서는 그저 겸양의 태도로만 받아들인다.
솔직히 대통령이 되면 뭐하나. 옛날 같지 않아 국회라는 암초에 걸려 아무 일도 못하는 판이다. 대통령이 안쓰러워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게다가 안 좋은 일만 터지면 무조건 대통령 탓이다. 불량 여객선도, 전염병도, 찜통더위도 다 대통령더러 사과하란다.
바쿠네초프 대통령을 보라. 나라의 미래를 위해 4대개혁을 추진한다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다. 국회가 틀어버리는 바람에 개혁안마다 빈껍데기 신세다. 모두가 국회선진화법 탓인 줄을 이제야 깨닫는 눈치다.
이럴 바에야 국회 안에서 숨은 권력을 즐기는 게 백번 낫다. 키모센코가 한때 이원집정제 개헌론을 꺼낸 것도 그런 속셈에서였다. 물론 개헌 바람잡이는 실패로 끝났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국회에는 이미 의원내각제를 뛰어넘는 입법독재 시스템이 착실히 터를 잡아가고 있다.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에 국회가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이 화룡점정이었다. 바쿠네초프가 미리 알아채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물 건너간 것은 안타깝지만 어차피 이보 전진 일보 후퇴다.
이미 나라 권력의 핵심은 국회로 옮겨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상층부만 장악하면 대통령 부럽지 않은 권력을 향유할 수 있다. 여당 조직은 이제 거의 손안에 들어온 셈이다. 바쿠네초프 파벌 실력자들이 걸림돌이긴 하나 이왕코프 전 총리는 이미 날아갔고 2인자임을 자처하는 차이코흐스키(차이콥스키 아님)조차 당내 세력은 키모센코에게는 족탈불급이다.
야당 지도부도 거의 이심전심 사이가 됐다. 키모센코에게 그런 정치적 동지라면 최근 셀프디스 형식으로 고해성사 중인 모제인 대표나, 젊은 시절 그리스 철학자 얼떨리우스의 저서를 즐겨 읽었다는 안톤 찰스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 모두 만년 야당인사로 운명지어져 있다는 점이다.
물론 키모센코가 철도공사 개혁 막판 노조에 아부하거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맹탕으로 끝낸 것을 놓고 비판하는 여당 내 목소리가 있음을 잘 안다. 그게 다 노동계와 공무원 세력을 끌어들여 정치적 자산을 비축해놓으려는 심모원려 아니겠는가. 정치는 딜이다.
키모센코가 정작 간담을 쓸어내린 것은 피라냐당 때문이 아니었다. 등 뒤에서 라이벌이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한때나마 집권당 원내대표로 욱일승천의 기세를 보이던 요승(妖僧) 쇼민이 그 주인공이다. 바쿠네초프와 이이제이하도록 놓아뒀으면 딱 좋았을 텐데 아까운 인재다. 그는 정치가로서의 책략도 키모센코를 능가할 정도였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빌미로 국회법 개정을 야당에 팔아넘기고, 그것도 모자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한 보조금 살포로 시민단체들을 정치적 아군으로 끌어들이려던 수완은 키모센코조차 괄목상대할 만했다.
불행히도 쇼민의 운세는 거기까지였다. 높은 산에 오르자 자신의 키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줄로 착각한 것이다. '한비자'를 거꾸로 읽은 결과다.
역시 일격필살은 바쿠네초프를 따를 용자가 없다. 그가 쇼민에게 보낸 최후의 메모는 지금 읽어봐도 명문이다.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구현했고 기묘한 속셈은 지리를 통달했도다. 이미 전적이 화려하니 이쯤 해서 족함을 알고 그치기 바라노라."
사람이 운이 좋으면 앞으로 넘어져도 금반지를 줍는다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야당 혁신위원회까지 국회의원 수를 369석으로 늘리자면서 최악의 수를 두고 말았다. 맙소사 368도, 370도 아니고 하필 369석이 뭔가. '삼육구 삼육구'하면서 국회를 꽃놀이패 삼아 인생을 즐기자고 했으니 그러잖아도 삶에 지쳐 있는 국민의 화를 돋우고 말지 않았는가.
이렇듯 여야 정치권 모두가 물심양면 키모센코를 도와주려고만 하니 그 덩치에 몸 둘 바를 모를 지경이다. 아몰랑∼.
이신우 논설실장 shinwoo@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