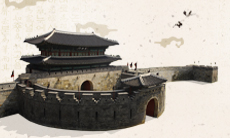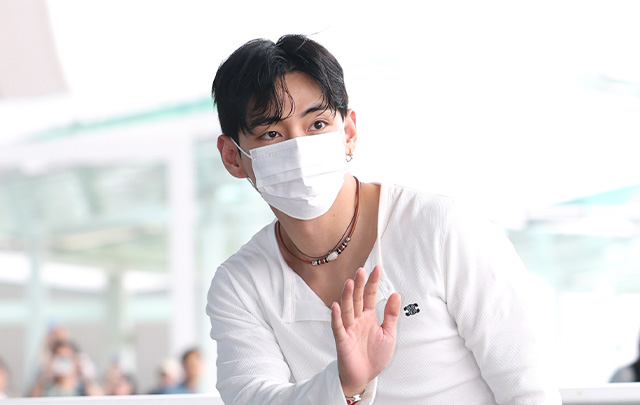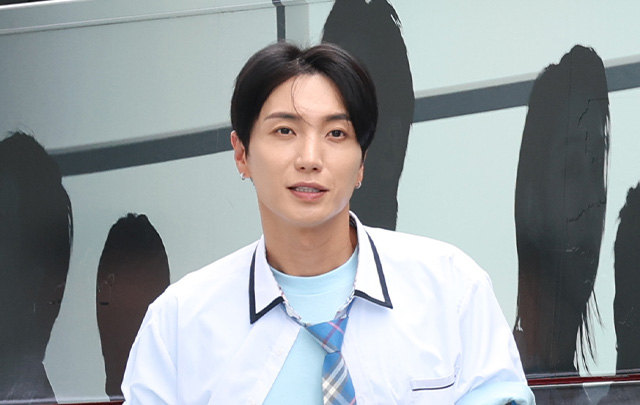현대건설·우리금융등 대형 M&A 잇단 무산, 왜?<br>감독당국 '변양호 신드롬…' 관치 역풍 우려 개입 자제… 소심한 대처가 禍 키운셈<br>대리인 역할해온 채권단…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에 부실심사로 혼란 부추겨
판은 결국 깨지고 말았다.
우리금융지주와 현대건설은 외환위기의 상흔(傷痕)이었다. 두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들어간 혈세만도 14조원을 넘는다. 이들의 매각작업은 두 회사의 명운(命運)뿐 아니라 대우조선해양과 하이닉스반도체 등 대형 기업의 앞날까지 가늠할 시금석이었다.
매각을 성공리에 끝내면 '구조조정의 화타'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흠집을 남기면 갖은 후환에 시달릴 판국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국은 외환은행을 팔았다가 형틀에 갇힌 '변양호 신드롬'의 가위에 눌려왔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였다.
공교롭게도 17일 두 회사의 매각작업은 동시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예상대로 후폭풍은 거세다. 현대건설은 소송전을 치러야 할 판이고 우리금융은 원점에서 새 판을 짜야 한다. 시장에서는 벌써 판이 깨진 원인을 놓고 말들이 많다. 물건을 살 사람이 부족했다는 수요공급의 문제부터 국내외 시장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저에는 당국의 소심함과 부족한 상황 판단력, 여기에 대리인 역할을 해온 채권단의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깔려 있다. 물건을 팔 사람들의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 살 사람까지 혼란에 빠지고 이 과정에서 당국의 시장장악 능력이 떨어지면서 또 다른 혼란을 잉태하는 악순환이 나타났다는 뜻이다. 국책연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KB금융 사태 등에서 문제에 부딪힌 당국이 '관치의 역풍'이 불까 봐 개입을 자제해왔다"면서 "결과적으로 당국의 소심함이 화를 키운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대건설의 경우 감독 당국의 안일함과 채권단의 허술함이 결합된 '부실 매각전(戰)'이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 인수대금 중 1조2,000억원의 대출금을 인지했으면서도 단순 감점에 그친 채 입찰제안서 마감 하루 만에 현대그룹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혈세가 투입된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은 채권단의 한 축임에도 조기매각, 매각대금 극대화를 외치는 외환은행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했다. 당국은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 상황에서도 정책공사에만 맡긴 채 게임에서 빠졌다. 이 관계자는 "'승자의 저주'에 빠진 대우건설의 상황이 재연될 것을 당국이 너무 두려워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 또한 큰 틀에서 현대건설과 비슷하다. 물론 강력한 후보였던 하나금융이 빠진 상황에서 당국이 쓸 패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당국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민영화 형식 자체에 집착했던 것에 대한 비판에서까지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평가다. 한 M&A전문 변호사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신속한 민영화라는 두 가치는 양립하기 어렵고 처음부터 시기를 정해놓고 M&A를 한 것이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번 매각은 처음부터 '선수 부족'이 예견됐던, 어려운 게임이었다. 외국 자본을 사실상 배제했고, 국내에서는 산업자본에게 경영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제한까지 맞물려 있었다. 당국은 대기업 3~4곳과 국민연금 등이 사모펀드(PEF)를 만들어 들어오기를 바랐지만, 정작 기업들은 생각이 없었다. 경영권도 갖지 못하는 터에 소수 지분을 가져 본들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공격만 당할 수 있는 탓이었다. 그나마 인수에 욕심을 부렸던 산업은행 등마저 정부가'선 자체 민영화'원칙을 강조하면서 손발을 묶었다.
선수 부족이 이렇게 예상됨에도 당국은 분리매각 여부 등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지 않은 채 입찰자의 상황을 본 뒤 결정하겠다고 얘기했다. 한 M&A 전문가는 "투자자설명회(IR)을 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했다"라고 지적했다. 박병무 보고펀드 대표 역시 "정부나 채권단 주도로 이뤄지고 공정성을 중시하다 보니 절차가 너무 경직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강력한 후보였던 우리금융컨소시엄이 막판 프리미엄 완화를 요구하면서 돌연 인수 불참을 선언한 것도 결국에는 당국이 만든 선수 부족의 한계를 시장이 이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